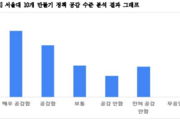자동차보험을 들면 챙겨주던 전국 지도책은 우리나라를 품은 듯 늘 든든했다. 그러던 ‘지도책’이 없어졌다. 내비게이션에 밀린 탓이다. 학생들도 당당히 되묻는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굳이 지리 공부해야하나요?”라고. 하지만 지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세계가 보인다. 올바른 지역 이해는 올바른 지리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애쓰는 지리교사모임 ‘지평’을 만났다.
지리공부는 고등학교가 끝? … “마지막 수업 안타깝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리 공부 해 본 적 있으세요?” 지리교사모임 ‘지평(地平)’ 인터뷰는 역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지평은 ‘지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지리교사들의 모임이다. 지난 1996년 출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글쎄요, 관광지도 들여다 본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조금 민망했다. ‘지평’을 만나기 전까지 지리라는 과목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저희는 학생들한테 지리를 마지막으로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합니다. 국·영·수는 물론 역사나 과학 등 다른 과목들은 대학이나 사회에서 종종 접할 기회가 있지만, 지리는 대부분 고등학교 수업이 마지막이죠.” 지리교사 경력 17년의 이준구(서울이화여고) 교사는 고교 지리교육을 ‘마지막 수업’에 비유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지리는 딱딱한 과목이었다. 기후와 지형, 자원의 생산량과 분포 등 외울 것도 많았다. 지리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을 융합한 학문이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이 전제돼야 한다. 당장 대학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만 따진다면, ‘한가한 소리’하고 있다고 할 테지만, 지리야 말로 ‘사람 사는 모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공부’이다. ‘지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리의 매력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내비게이션 있는데, 굳이 지리 공부해야 하나요?”
지리 교사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질문은 두 개다. “이게 수능에 나오나요? 어렵나요?”라는 질문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지리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어쩔 수 없는 세태라고 애써 마음을 달래 보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다. 이 교사는 “요즘 회자되는 일명 ‘인구론’이란 말처럼 인문계 나와서 먹고살기 힘든데 지리공부가 취업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정적 인식이 가장 안타깝다”며 “학생 선택에 의해 교과목 서열이 정해지는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사회탐구과목의 정체성은 수능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은 수능에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렸고, 지리는 뒷자리로 밀려났다. 더욱이 인터넷 발달과 내비게이션의 등장은 지리 교과를 학생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투영되고 있다. 고교는 물론 중학교 일반사회에서도 지리가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은 크지 않다.
지리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득 심어주는 게 ‘꿈’
멀어져 간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배낭 하나 메고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고 온 한비야처럼 학생들이 지리의 매력에 푹 빠질 수는 없을까. 지리교사모임 ‘지평’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지난 1996년 봄날, 이순용(서울이화여고) 교사를 비롯해 서울 시내 지리교사 7명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장 좋은 지리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우선 교사들은 지리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입견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지리적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힘을 쏟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