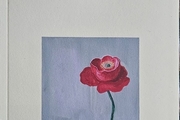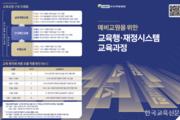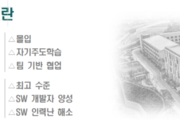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생의 장기 결석률이 점점 상승하더니 점차 초등학생의 장기 결석률도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등교하지 않는 아이의 수가 급증하고 그들에게서 공통적 요인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신조어가 등장했다. ‘등교 거부’가 아니라 ‘부등교(不登校)’라는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국내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불편을 ‘위기’로 오해하는 부모
최근 일본에서는 수학여행 중 아이가 “재미없다”고 부모에게 전화하자,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자녀에게는 어떠한 불편감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극성이라고 하기엔 왠지 씁쓸하다. 어쩌면 아이가 재미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큰 문제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우관계가 불편해진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대안학교 정보를 찾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필요성이 자녀의 불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 최근 자녀가 교우관계를 불편해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부모도 늘었다. 불편해 하는 특정 학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하기도 한다. 자녀의 불편함은 큰일이나 병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재료다.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가 오히려 아이의 회복력을 약하게 한다.
일본에서 부등교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밝힌다. “세상의 반대 경험이 적을수록 학교의 규칙과 관계를 참기 어려워한다.” 아이의 욕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반대하지 않는 부모가 과연 이상적인 부모일까? 연구자들은 한 번도 꾸짖지 않고 아이를 키운 부모의 자녀들을 주목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의 간단한 규칙에도 큰 위협을 느낀다.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슷하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블록을 먼저 잡았다고 떼를 쓰고 울면, 부모는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놀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장면을 흔히 본다. 이러한 해결책은 일시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이의 감정 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러다가 한국에서도 등교 거부를 일본처럼 자연스러운 ‘부등교’로 보려는 부모들이 늘어날까 두렵기만 하다.
한국 부모가 보이는 위험 신호
이미 한국의 초등학생 부모의 과잉보호는 담임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혹은 신체폭력으로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자녀의 부정 정서를 철통방어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다. 2023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초등생의 장기결석·미등교율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세다. 서울대 아동·가족학 연구(2022)는 “부모의 과잉 개입과 정서 과보호는 아이의 좌절 내성 및 사회적 적응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우울·불안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즉, 아이 대신 불편과 불쾌감을 죄다 없애면 아이는 현실에서 지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모에게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화 주인공 라일리의 다섯 가지 감정 중 기쁨이가 제일 나대지만, 결국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감정은 슬픔이었지 않은가? 여기서 슬픔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자신의 불편한 감정들을 공감받고 치유되면서 느끼는 연합의 감정이다.
일본의 부등교 연구자들은 경고한다. 부모가 아이의 불쾌감을 두려워하면, 아이는 오히려 그 불쾌감을 이용해 부모를 통제하게 된다고. 공감은 불쾌감을 없애서 속히 해결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물과 분노를 함께 견뎌줄 때,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견뎌낼 힘을 배운다. 아이의 감정을 대신 보호하는 부모에서, 아이의 감정을 스스로 견디게 만드는 부모로 전환하자.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 자녀가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