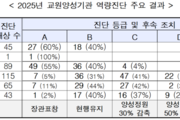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일본 출신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 광원인 푸른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한 공로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 출신 노벨 과학상 수상자는 19명이며, 일본 국적 수상자는 17명이 됐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많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한일 노벨 과학상 수상자 차이를 스포츠경기 스코어처럼 빗대 ‘0대19’라는 용어를 쓰며 자조 섞인 푸념을 털어놓는다. 일본과의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이 같은 현격한 차이가 가져다주는 아쉬움이 무척이나 큰 것 같다.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최초 수상자’ 탄생에 대한 기대는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최초 수상자가 나온다면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인 투자 촉진, 많은 인재 유입 등 대폭적인 연쇄반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벨과학상은 오랫동안 과학연구에 헌신한 결과로 받는 것이지, 군대 작전이나 기업 사업계획처럼 비교적 단기간 승부를 걸어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 노벨상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딛고 이뤄진다.
노벨상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로 삼는 식의 조바심만 키우는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인재와 자금이 몰리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어려서부터 상상과 창조를 강조하는 과학으로, 지금보다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절실하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게다가 실적 중심의 연구로 과학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노벨상은 고사하고 일반기술조차 제대로 개발되기 힘들다.
정부는 과학에서 만큼은 ‘빨리빨리’를 버리고 차분하게 미래 기술 연구의 청사진을 펼치길 바란다. 노벨과학상 수상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물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조적 분위기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학과 기업의 분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