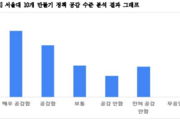5월의 푸른 하늘은 늘 깨끗하고 맑다. 그런데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를 보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은 왜일까? 요즘 들어 교직에 환멸을 느낀다는 동료 교사들이 많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 중에 한사람인지도 모른다. 조회시간, 한 아이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 나에게는 비수(匕首)처럼 들렸다.
“선생님,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아이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이 없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아이의 다음 말이 나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과 스승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교단에 선지 10년이 넘은 지금. 처음에는 교직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만 개의 분필로도 아직까지 내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쓰는 나다.
지금까지 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 항상 이 아이들 앞에만 서면 내 자신이 작아지는 이유는 너무나 지나치게 지식만 강요한 탓인지도 모른다. 진정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을 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설렘이 지금은 어떠한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보람보다 허탈감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앞에서 웃음이 나와 혼 줄은 났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살아 있지 않았던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면서도 언제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했었다. 십 년이 지난 지금 절로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스승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껴본다.
스승의 날 기획 차원으로 모 리서치에서 실시한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중,고생 2명중 1명이 교사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 존경심도 ‘더 떨어졌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해심 많은 선생님’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은 ‘편애(차별)하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10명중 8명이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학부모나 그 누구로부터 평가받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모순(矛盾)이 아닌가? 그러고도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누구의 탓도 아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낸 인과응보(因果應報)이자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것이다.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듯 싶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선생(가르치는 사람, 교사)과 스승(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 사부)’의 사전적 의미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선생은 지식(知識)을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일시적이고, 스승은 자신의 인격(人格)을 형성시켜 주는 사람으로 영원하다고 단정짓고 싶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명제 하에 다시 뛰는 우리 선생님이 되었으면 한다. 언젠가는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당당하게 말하자.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