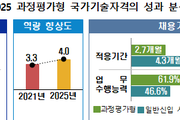얼마전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청과는 다른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들었던 얘기다.
도단위 학교라서 소규모 학교가 유난히 많은데 그곳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실 직원이라고 해봐야 행정실장인 본인과 조무원 1명, 교무실에 행정보조1명 밖에 없는 단촐한 살림이란다. 물론 교사도 몇 명 되지 않지만.
문제는 엊그제 인근 초등학교들이 수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체육대회(아마, 배구대회를 했다는가 보다.)를 했는데 교사들만 무리지어 나가고 행정실장은 사무실이나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식에 쓸 학교 신용카드 챙겨가는 것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순간 그 동료는 정말 치욕감을 넘어서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자기가 무슨 학교 지키는 개도 아니고 과연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하는 자괴감마저 심하게 들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는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온갖 궂은일 다 맡겨서 하라고 해놓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쏙 빼고 가는 것. 혹시 그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교사들과 잘못 어울리는 이른바 ‘직장내 왕따’가 아닌가 의심도 해봤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거지를 보니 그것은 아닌 듯 싶다.
위의 사례는 비단 어느 한 두 학교에서만 생기는것이 아니다. 소수 인원이라는 비애로 인하여 단위학교에 근무하기를 행정직들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영국사람에게는 ‘젠틀맨 골퍼상식’이라는 것이 있다.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한 사람이라도 골프에 대하여 모른다면 절대 골프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에티켓이다. 하물며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삶을 몸소 가르쳐야 하고, 학생에게 보여주어야 할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다니 기분이 영 씁쓸하다.
단지 식사를 같이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은 것이 섭섭했을 터이다.
아무리 같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교육가족으로서 같이 행동하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은다면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교직원간 갈등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지 않을까?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