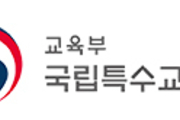지난달 10월 30일은 저축의 날이었다. 삼십여 년만 해도 저축은 미덕이라는 사회적 구호에 맞춰 달마다 저축할 돈을 얼마씩 가져오는 것이 연례 행사였다. 지금이야 없겠지만 중학교 때는 각 반마다 저축 참여율(금액은 별도로 하고)을 실적으로 매겨서 그 과도한 경쟁의 폐해로 인해 돈을 안 가져온 애들은 집에 돌아가게 하여 가져오게 한 적도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에게 얼마를 빌리면 다행이었지만 그것도 못한 주변머리 없거나 가난한 애들은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일이다. 6년간 저축을 했었는데 달마다 적을 때는 5백 원, 아주 가끔은 천 원(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기분 좋아 호주머니 비상금을 털어주거나 친척들이 다녀 갈 때 주신 용돈일 경우가 많았다)을 가져갔던 기억이 있다.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양극화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가 공무원이나 농협직원 등 이었던 애들은 2천 원에서 5천 원까지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었다. 저축을 할 때는 보라색 통장과 함께 돈을 담임선생님께 드리면 직접 통장에 금액을 적으신 후 돈을 모아 두었다가 우체국 직원이 오면 넘겨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6년간 모아보니 전체 금액이 3만 원 인가 5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저녁 소주와 안주값 정도 금액이었겠지만 그때는 한 번 만져 보기도 힘든 큰 금액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선물로 만 원짜리 전자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두꺼운데다 시간과 날짜만 나오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싸구려였다. 친구들은 삼촌이 중동에 가서 벌어온 달러로 사준 자석이 달린 필통과 멋진 전자손목시계, 그것도 야광, 초시계 기능, 방수기능 까지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투박한 시계였지만 처음 차보는 것이라서 설레는 마음은 지울 수 없었다.
요즘도 각 학교에서 저축이라는 것을 해도 그 의미는 예년에 비해 많이 탈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애들마저도 저축이라는 개념에 대해 무관심하고, 부모에게서 많은 용돈을 손쉽게 탈 수 있는 세태로 변해서 저축의 교육적 효과도 반감되어서 그런지 과거의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거기에다 학교에서 저축으로 걷힌 돈을 유치하려는 퇴직 교육 관료가 만든 금융조합에 몰아주다 보니 다른 은행에서 불공정마저 제기하는 일까지 간간히 있는 형편이다 보니 신뢰성까지 동반 추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저축이라는 업무를 교육 외 업무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단체협상을 통해 행정실로 이관하여 서로 간에 업무분장을 놓고 알력이 벌어지는 일까지 생기기도 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그러하기에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인 패러다임 중에서 경제 개념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경제가 세계화 되지 않은 때에는 국민들의 돈을 은행에 쌓아 놓은 채 기업들에게 빌려 주던 그런 시절은 아닌 것이다. 또한 애들에게도 과거와 같이 돼지저금통에 한 푼 두 푼 모으도록 하게 하는 기초적인 교육적 효과는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하되, 학교에서는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경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처럼 어렸을 때부터 바람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선진 노사관계 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경제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님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실물 경제 흐름 등을 가르치는 것 말이다. 여기에 더 보태서 경제교사 10명 중 경제학 전공이 1명 뿐(2007.11.9. 연합뉴스 기사 참조)이라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이론 위주의 경제교육이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수급 정책과 더불어 교육연수의 고려도 있어야 하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