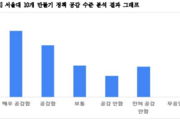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가 나왔다고 한다. 거기에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목표, 그리고 193개의 국정 과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성공 그리고 나눔’이라는 표제 속에 담겨 있는 상생과 발전, 성장과 조화가 공교육을 살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선생님 존중’이야말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은 참으로 옳고도 다행한 인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존중되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달려와서 선생님을 욕하고 두들겨 패는 일이 계속되는 한 제대로 된 교육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얼마 전 충북에서 일어난 교사 폭력과 같은 사례가 현존하는 한 우리 교육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 신문에는 ‘휴대폰 문자테러에 교사들 속앓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그 욕설이나 비방 속에는 선생님들이 모욕감을 느낄 만큼의 심각한 내용도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언제부터 우리 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버린 오늘의 쓸쓸한 풍경을 누구를 탓해야 할까. 어찌됐든 일차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극히 소수이지만 촌지 수수를 하거나, 탈법 불법행위를 했던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또한 지나치게 집단적 사고에 경도되어 교육의 진정성과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해타산에만 집착해 온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또한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다. 우선은 교육을 시장논리로 파악했던 '국민의 정부'의 책임도 크다. 또한 교원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저항 세력으로 매도하여 국민과 갈라놓았던 노무현 정권의 그릇된 교육관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 지난 10년 동안 선생님을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갈라놓았던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이런 상황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요란을 떨면서도 번번이 교사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궁지에 몰린 선생님들이 변화의 주도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교육은 선생님이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변화의 주도자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만이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자고 나면 교원들의 부정적 측면을 언론에 도배질하며 함께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잘못한 우리 동료를 감싸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선생님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대드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교권의 추락’과 관련이 깊다. 선생님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이 있는 한, 교육을 시장논리로 해석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한 우리 교육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지난 대선과정,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약속했던 교육관련 공약들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교육의 중심에 서서 소신껏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일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