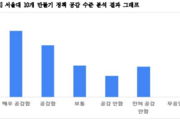문득 2003년 동아일보 주최 12월 인터넷 생활수기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기자와의 인터뷰가 생각난다. 우선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고 싶다.
기자: 선생님, 직업이 무엇입니까?
환희: 교사입니다.
기자: 어느 학교에 근무하십니까?
환희: 강릉문성고등학교에 근무합니다.
기자: 제가 강릉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데 그곳에 문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까?
환희: 예, 역사가 짧지만 명문 사학고로 발돋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기자: 남고입니까? 여고입니까?
환희: 남․여 공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자: 예, 그렇게 하세요.
환희: 오늘 인터뷰 내용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까?
기자: 아마 내일 신문에 나올 겁니다.
환희: 그렇다면 제 이름 앞에 강릉문성고등학교라는 학교명을 꼭 좀 써 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희: 농담입니다만 기자 선생님처럼 강릉에 있는 저희 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 학교를 알리려고요.
기자: (웃으면서) 하 하, 학교를 PR하는 방법이 대단하군요.
환희: (멋쩍어 하면서)별 말씀을…….
그리고 다음 날, 출근길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들러 동아일보를 한 부 샀다. 지난 날 기자에게 농담조로 한 이야기가 과연 기사에 실렸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신문의 전면(全面)을 뒤져보았다. 그런데 사회면에 내 사진이 크게 실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현재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소속감에서 나온 발현(發現)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해보게 된다. 1990년도 대학을 마치고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곳이 이 곳이었다. 교사로서의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평생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격변하는 사회 변화, 특히 IMF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교사라는 직업 선택에 그 어떤 만족감(滿足感)을 느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IMF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명퇴(명예퇴직)를 권유받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의 직업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직장의 발전과 안녕(安寧)이 곧 나의 발전에도 연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학교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처음 교단에 설 때의 설렘이 지금은 어떠한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보람보다 허탈감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앞에서 웃음이 나와 혼이 났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살아 있지 않았던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면서도 언제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했었다. 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절로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스승의 길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껴본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학생이자 스승일지도 모른다.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할 줄 알면 스승이 되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인생 공부가 더 필요한 학생이 된다. 가장 좋은 스승은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하는 사람이며, 그런 스승은 학교뿐 아니라 직장, 친구, 선후배, 부모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학생 같은 선생님', '선생님 같은 학생'의 마음으로 영원히 이 교단을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이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스승의 날 기획 차원으로 모 리서치에서 실시한 '학생이 바라보는 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중고생 2명 중 1명이 교사 지위가 '과거보다 더 낮아졌다', '존경심도 더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해심 많은 선생님'이었고,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은 '편애(차별)하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10명 중 8명이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을 위해 어디에선가 묵묵히 참교육을 실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리라 본다. 교사로서의 자세가 흔들릴 때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사도헌장을 읊조리며 내 자신을 담금질 해 본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빨리 거듭나기를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