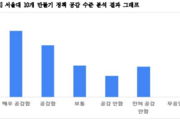교사들이 학교에서 피하고 싶은 일이 ‘생활지도’라고 한다. 크고 작은 일로 학생들과 잦은 마찰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학부모나 외부기관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절차에 따른 생활지도가 ‘인권 침해’라 하여 민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야말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는 ‘뜨거운 불’에 비유되기도 한다. 뜨거운 불을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거나 옷을 태우게 되는 것처럼, 생활지도를 가까이 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골치를 앓게 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년 초 생활지도부장을 선임하는 데 애를 먹는다. 소위 학교의 3D에 해당되어 모두가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새로 전입한 교사가 맡기도 하고,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억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다. 생활지도는 교과지도, 교무업무 등과 함께 교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지만 서로 피하려고만 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는 현행 의무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문제 학생을 처벌하거나 제척할 방안이 전혀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또한 적절히 이용하기도 한다. 잘못에 대하여 벌을 주면 거부하거나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막가파’식 거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만 탓할 수도 없다.
또 하나는 최근의 ‘인권 강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학생 사안을 ‘인권’과 결부시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인권 침해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학생의 본분과 이무 이행에는 눈을 감고 있고, 처벌에 따른 학생의 고통과 어려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한 예로 평소 잦은 비행을 일삼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여 교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자 하였으나,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에서는 이를 인권문제로 부각시켜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학생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을 찾기보다는 약자(?)로 전락한 학생과 학부모의 읍소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이 일이 있는 후 학교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킨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한 지도와 처벌을 통해서 교정의 기회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우리교육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쯤 되면 학교마다 다수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 학생이 교실 수업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학창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닌가. 한 학생만 수업 중에 엉뚱한 일을 하거나 제멋대로 하면 그 수업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이렇게 다수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언제까지 ‘인권강조’만 하고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물론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보호 받을 만한, 상응한 의무를 다한 경우는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친구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훼손하는 비행, 일탈학생의 경우에는 인권논의에 얽매여 교정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앞서 교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엄격한 교육을 제창한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가르쳐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을 논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말았다는 어느 교원단체 간부의 때늦은 후회를 새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서도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