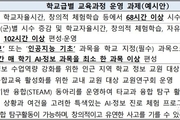어릴 때 신발을 새로 사면 새것 냄새가 좋았다. 새것은 휘발성 냄새가 났다. 무슨 이유인지 그 휘발성 냄새가 좋았다. 지금도 아침 일찍 신문을 들면 코로 가져간다. 냄새 때문이다. 신문의 잉크 냄새가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신발뿐이 아니다. 새것에 대한 느낌은 늘 마음을 들뜨게 했다. 헌것은 남루하고 정이 안 간다. 반면 새것은 세련되고 신선함이 있다. 새것은 처음 만나는 설렘과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 새것은 나만 가졌다는 은근한 우월감도 함께 꿈틀거렸다.
새것에 대한 욕심은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인으로 박혔다. 디지털 세상에 부지런히 따라 간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사실 난 기계와 친하지 않다.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멈춰도 고쳐 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컴퓨터는 달랐다. 누구보다 먼저 286컴퓨터를 샀다. 그리고 도스 프로그램을 배웠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서 출간을 한 것도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 적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컴퓨터가 멀어져 간다. 5.25인치, 다시 3.5인치 디스켓에 자료를 저장하며 글을 썼는데 모두 잃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플로피디스켓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디지털 세대라고 자부했는데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다.
우리는 새것을 대할 때 쉽게 마음을 여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19세기말 이후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버릇이다. 옛것은 ‘구식’이었고, '서양의 것'은 늘 새것이 되었다. 옛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기고, 새것에 대한 갈증이 심해졌다. 급기야 서양의 것은 무조건 숭배 하는 경향이 생겼다.
물론 서양의 편리함이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새것을 맹신하고 옛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옛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에 고이 모셔 둘 것도 아니다. 한때 대학가에서 탈춤반 동아리 모임이 급속도로 번졌던 것처럼 옛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울이다.
새것에 대한 맹신은 자칫하면 귀중한 것을 잃게 한다. 무턱대고 쫓아가다보면 배려하는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 급기야 오만해지기도 한다. 오늘날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새것에 대한 집착이 남긴 그늘이다.
청계천 복원의 성공으로 우리 사회는 뒤늦게 옛것을 되살리는 즐거움에 빠져있다. 그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가상징거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동대문 운동장을 헐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문화 공간을 세운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쯤에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문장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爲文章如之何)”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지만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말이다. 이 말은 ‘法古而知變 創新而能典(법고이지변 창신이능전. 옛것을 본받더라도 변화를 알아야 하며 새로운 것을 창작하더라도 고전에 능해야 한다)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무턱대고 옛것을 경시하고, 다시 복원이라는 명분하에 부셔대는 것은 ‘법고’와 ‘창신’을 별개의 것으로 여긴 결과다. 복원이라는 이유로 새것을 만드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옛것을 잃는 꼴이 된다. 사실 새것이란 애초에 없다. 과거의 퇴적물이 쌓여서 새것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법고’와 ‘창신’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연암이 담고 있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다.
새것에 대한 맹목적인 마음가짐도 경계해야 하지만, 옛 모습을 찾는다고 무조건복원의 망치질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불에 타 버린 숭례문처럼 어쩔 수 없이 복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처음 모습이 아니라도 이미 변한 모습이 지속되었다면 그 시간의 퇴적도 우리가 기대고 싶은 풍경이다. 새로 복원했다는 오만함보다는 곰삭음이 뭉쳐 있는 모습에 더 정이 간다. 가능한 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서 온전한 옛것으로 남겨야 하는 것도 우리가 진득하게 간직해야 하는 삶의 태도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무변성에도 따뜻함이 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늘 보아오던 그 익숙함에도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