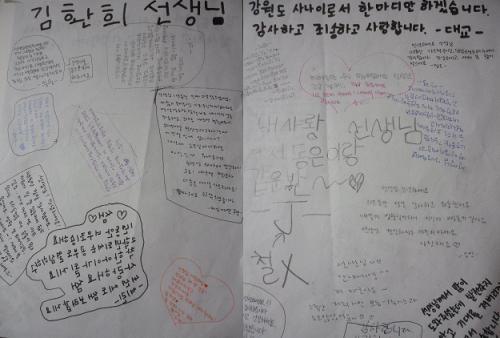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