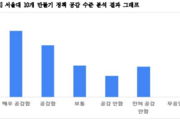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 연수원에서의 일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교원노사관계 선진화과정 연수를 받았다. 학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갈등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내용도 유익했지만, 쉬는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도 의미가 매우 컸다. 노후 생활을 위한 재테크, 건강관리, 심지어는 주름살 관리 등 다양한 화제들이 나왔다. 그 가운데에는 연수를 마친 지 두어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매주 머리를 염색합니다.”
머리카락의 색깔이 유난히 검고 윤이 나는, 그리고 2대 8로 단정하게 가르마를 한 어느 교장선생님이 ‘자연머리냐’는 물음에 답한 내용이다. 오십이 되기 전에는 새치 하나 없었는데, 오십을 넘기자마자 봄비에 새잎 피어나듯 흰 머리가 가득 나기 시작해서 염색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사십 초반부터 흰머리가 하나 둘 나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염색을 하게 된 지가 10년 이상 된 것 같다.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염색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염색이 머리카락만 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건과 세면대 그리고 침대와 베개까지도 더럽히고 만다. 염색 약 냄새도 고약하여 머리가 지근거리는 경우도 있고, 체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며칠씩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시력도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습관적으로 늘 염색을 해오고 있지만, 필자도 어느 때부턴가는 흰 머리 그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선 염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백발 자체의 중후함을 만끽하고 싶어서다. 오다가다 백발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백발은 가끔 남의 손에 쥔 떡처럼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하얀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경륜과 중후함,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필자는 가끔은 백발이 매우 잘 어울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였다.
“백발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백발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 중후함이 멋있잖아요. 시력까지 나빠진다는데 꼭 염색할 필요가 있어요. 이젠 교장선생님도 되셨으니 그냥 백발로 지내세요.”
우리들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흑갈색 머리로 산뜻하게 염색하고 다니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멋을 내지만, 교육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멋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란다. 요새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나이 먹은 선생님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 백발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디시 말하면, 아이들은 백발에서 중후함이나 카리스마를 느끼기보다는 현격한 세대 차이를 연상한다는 것이다. 그 교장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백발은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없게 하는 금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흰 머리카락이 한 오리도 드러나지 않도록 염색을 정성들여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중후함이나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교장 선생님에게 염색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한 친교의 메시지, 낮춤과 어울림의 메타포가 된 것이다. 어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춰야 하고, 젊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 또한 교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사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 염색 자체가 그리 대단한 영향을 미칠 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러나 정성들여 염색을 하는 것이 상대방만큼 자신을 낮추고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때, 그 낮춤과 어울림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슴속에 신선한 자극으로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