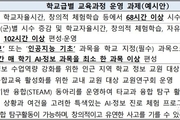풍경 하나 :
지금이나 예나 명절이 되면 꼬맹이들에게는 설렘이 가득하다. 특히나 예전 시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슈퍼마켓이나 장을 구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비린 음식을 많이 먹어보지 못하는데 명절은 별미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게다가 대처에 나갔던 형제자매들이 귀향을 해서 선물 한 꾸러미씩을 들고 오니 이 또한 기쁜 일중 하나였다. 더 좋았던 것은 어른들이나 형과 누나가 주는 세뱃돈 명목으로 주는 용돈이었다. 평소에는 거머쥐기 힘든 이 용돈으로 대개는 먹는 것을 사먹거나 조립하는 장난감, 화약총을 사는데 탕진해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떤 때는 동네 조무래기들과 같이 몰려다니며 세배를 빙자한 세뱃돈 받기를 한 적도 있었다. 그때야 고작 세뱃돈으로 100원, 많으면 500원을 받았던 추억이 있다.
그런 추억의 세뱃돈도 이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찬바람으로 인해서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모양이다. 화폐가치가 올라서 요즘 초등생에게는 5천원에서 1만원, 중고생에게는 1만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주는 것이 대개의 경우인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다는 말도 들려온다. 하기야 1만 원 정도의 세뱃돈도 어렵다보니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행되었다가 열흘도 안 되어서 자취를 감춘 100조 달러 지폐가 우리 돈 4천원에 세뱃돈 대용으로 거래된다는 웃지 못 할 뉴스도 들린다. 그 나라에서는 100조 달러라고 해도 겨우 달걀 3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나. 여기에 더해 옛 유고연방이 발행한 5천억 달러 지폐는 8천원에 살수 있다고 한다. 마음은 많이 주고 싶지만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밖에 못주는 어른들의 딱한 마음이 읽혀져서 마음 한쪽이 짠해진다. 그래도 주는 액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풍성한 마음만은 전해지리라.
풍경 둘 :
지금도 학교에서 저축업무를 하는 모양인데 예전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80년대에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거둬서 직접 통장에 금액을 적어 넣은 다음에 우체국 직원에게 넘겨줬던 기억이 있다. 보통의 아이들은 5백 원, 아버지가 공무원이나 조금 사는 집 아이들은 1천원이나 2천원 넘게 저축을 했던 것 같다. 6년간 이렇게 한푼 두푼 모았던 것을 졸업 전에 찾는데 2만원 조금 넘게 찾은 기억이 난다. 그것으로 어머니는 전자 손목시계 5천 원짜리를 사줬다. 졸업선물쯤 된 모양이다.
1960년대나 70년대는 나라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서 국가 차원에서 저축을 독려했다. 금융기관별로 할당액을 주고서 강제로 돈을 끌어 모아야 했고, 학교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코 묻은 돈일 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모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도로도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법 먹고 살만 하니까 저축이라는 개념이 은근슬쩍 사라졌다. 언론을 보니 작년 3분기 총저축률은 30.4%로 1982년 이래로 최저라고 한다. 여기에는 빚이 많은 가정들이 급증했고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려는 이유도 한몫을 했으리라.
그래서 그런지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권에서 저축 캠페인을 나선다는 소식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 만의 일이란다. 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저축을 독려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떠들썩하게 할 모양인데 세월은 돌고 돈다더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 기회에 흐트러진 학생들의 저축의욕도 한번 고삐를 잡아주기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학생들 대개가 부모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의무감 비슷하게 내는 성격이지만 계획성 있게 용돈을 운용하고 아껴 쓰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축은 어느 정도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