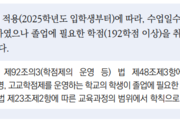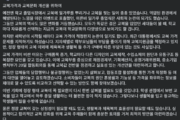01
이번 여름을 지나오면서, 아름다운 감화(感化)로 내 내면에 들어와 준 시 한 편이 있다. 그것은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였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무언가 내 심신이 찌들어 있음을 나의 온 지각(知覺)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전에도 나의 ‘찌들어 있음’을 각성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수준에서 해 본 생각이었다. 이번처럼 온 몸의 오묘한 울림으로 체득(體得)되는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
이 시의 제목은 ‘오래된 기도’이다. 그런데 이런 제목과는 달리 나에게 주는 느낌은 ‘새로운 기도’처럼 다가왔다. 그 느낌은 참으로 묘해서 감화의 마력을 불러 오는 듯 했다. 즉 이렇게 오래된 기도가 진작부터 있어왔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더구나 이 시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도 모두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런 기도를 해 볼 생각조차도 못하고 지내왔구나 하는 느낌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그저 상투적인 뜻만 알고 있었던 나에게는 일종의 감화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놀랄 만한 새로움의 각성이 ‘오래 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왔다.
‘오래된 기도’는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상당 기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된 기도’는 새로 나온 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교적 오래 된 시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시가 초면은 아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시가 아니었음에도, 이 시가 특별히 새롭게 다가온 것은, 내 삶의 맥락과 연결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의미를 발휘하는, 그런 시는 없다고 본다. 시가 교육과 문화 등의 제도 속에서 작용하는 동안 사람들이 시를 절대적인 것인 양 몰고 간 탓이리라. 어떤 시가 어떤 의미를 각별하게 지니는 것은 그 시의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구체적 삶의 상황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했을 때이다. 그러니까 ‘오래 된 기도’는 이번 여름 나의 구체적 삶의 상황 맥락에서 내가 조우한 시이다.
02
고령이 되시면서 어머니는 쇠약해지셨다. 지난 5년 동안 두 번의 큰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력 약화로 여러 질환을 크게 앓으신 후에, 눈에 뜨이게 기력이 쇠해지셨다. 옆에서 살펴드리지 않으면 혼자 지내시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올 봄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그런 어머니와 일상을 같이 하면서, 어머니의 힘든 실존을 마음 아프게 확인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뭇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늘 스스로 안달을 태운다고나 할까. 마음이 화평을 얻지를 못했다. 그것은 딱히 효성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늘그막 실존에 드리워진 불안하고 두려운 그림자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나의 불안한 노후도 어둡게 연상되어 왔다. 노환이기에 병원을 가 보아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책은 없었다. 달리 방책이 없다는 것이 주는 막막함 때문에, 그야말로 막막한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근원도 없고 지향도 없는 막연한 원망(怨望) 같은 것이 스멀스멀 벌레처럼 기어 다니는 듯 했다. 어쩌다 기도를 해도 그 언어는 겉돌았다. 정작으로 위로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인데도, 내가 오히려 위안과 화평이 필요한 듯했다.
그즈음에 만난 시가 바로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이다.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근간 내 안에 있던 불안과 불만, 두려움과 짜증 등을 내몰 수 있었다. 마치 주문(呪文) 같은 효과가 있었다. 아니 주문처럼 암송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감사가 찾아왔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