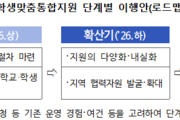지난 1~4월 개봉작중 5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블랙팬서’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다. 2월 14일 개봉한 ‘블랙팬서’의 관객 수는 539만 6881명(5월 2일 기준)이다. 4월 25일 개봉, 상영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관객 수는 624만 9392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개봉 8일 만에 동원한 관객 수다.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예측불가다.
이에 비해 지난 1~4월 개봉작중 최다 관객 한국영화는 341만 7615명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 지난 해 말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 벌’, ‘1987’이 각각 500만 명 이상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최다 관객 2위 한국영화는 3월 28일 개봉한 ‘곤지암’(감독 정범식)이다. 관객 수는 5월 2일 기준 267만 4924명이다.
그러나 실익면에선 ‘곤지암’이 ‘그것만이 내 세상’을 압도한다. 훨씬 더 대박인 것. 총제작비 22억 원의 ‘곤지암’은 267만 명인 반면 58억 원의 ‘그것만이 내 세상’은 341만 명이기 때문이다. ‘곤지암’은 손익분기점 70만 명쯤이지만 267만 명, ‘그것만이 내 세상’의 경우 210만 명에 341만 명뿐이니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먼저 ‘곤지암’이 새로 쓴 역사부터 살펴보는게 유익할 듯하다. ‘곤지암’은 ‘장화, 홍련’(2003)에 이어 역대 한국공포영화 흥행 2위로 올라섰다. 이전 흥행 2위는 ‘폰’(2002)이었다. ‘곤지암’의 3월 31일 하루 관객 수는 42만 3394명이다. 이는 역대 공포영화 최고 1일 스코어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전 공포영화 1일 최고 스코어는 ‘겟아웃’(2017)의 33만 3900명이었다.
또한 ‘곤지암’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개봉 5일 만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한국공포영화 가운데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이다. 역대 외국공포영화 최고 흥행작 ‘컨저링’(2013)의 100만 돌파 기록보다 나흘이나 앞선다. 기록은 이 정도로 그칠 것같지만, 그 동안 침체가 계속됐던 한국공포영화의 부활을 알린 ‘곤지암’의 의미는 각별해 보인다.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양신경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다. 2012년 미국 CNN이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로 선정한 바로 곤지암 정신병원이다.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 폐원했지만, 집단 자살이나 병원장 실종 등 영화 속 설정은 허구다. 건물 주인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촬영은 부산의 한 폐교에 지은 남양신경정신병원과 똑같은 세트에서 이루어졌다.
영화는 크게 디데이 전 공포체험단 미팅 과정과 곤지암 체험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극영화 구성방식은 아니다. 물론 영화시작후 약 18분부터 70분 남짓 펼쳐지는 ‘라이브 호러쇼’가 주를 이룬다. 100만 뷰를 목표로 한 인터넷 생중계 내용이 귀신 이야기라니 전통의 ‘처녀귀신’이 울고갈 공포영화의 진화라 해야 할까.
영화는 일단 귀신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오싹하게 하는 공포감 조성에 성공하고 있다. 아마 BJ식 체험형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보는 듯한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래서 생생해 보이는 전개방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극영화도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포체험 영상이 10~20대의 호기심을 잔뜩 부추겼을 법하다.
공포 분위기는 조명발이기도 하다. 해당 부분만 랜턴으로 보여줘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 따위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식이다. 가령 강림의식후 촛불이 꺼지고, 본부석 전원이 나가고, 휴대용 가스곤로에 자동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부분을 비추는 조명 등이다. 또 여러 명이 떼로 하는 체험이라 서로 다투고 악 쓰는 자체가 공포감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지 싶다.
일반 극영화 구성방식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지만, 따로 결말이 없는 공포체험 현재진행형 엔딩은 좀 아니지 싶다. 공포에 도취 또는 함몰되었으면 되었지 무슨 결말이 따로 필요하냐는 것인가? 배우들이 관객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도 공포감을 강요하는 듯 보여 좀 아쉽게 느껴진다. 웃음을 강요하는 억지 코미디처럼 말이다.
드라마에서 낯이 익은 박성훈(성훈 역)을 빼고 대부분 배우가 신인인 점도 새겨볼만하다. 배우 전원이 신인이라 “일반인이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 공포감과 사실감을 극대화한다”(서울신문, 2018.3.21.)지만, 낯선 얼굴들이라 누가 누군지 다소 헷갈린다. 그것이 오히려 영화 이해의 걸림돌로 작용한 듯해 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