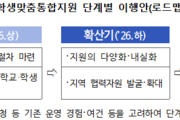좋은 기획안의 조건 : 공감과 로그라인
기획은 거창한 문서나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다. 상대가 원하는 바를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공감에 기반한 훌륭한 기획이다. 달걀을 예로 들어보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 달걀을 깨 달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달걀을 깨 달라고 하면 그 순간 달걀은 너무도 어려운 식재료가 된다. 케이크는 전문가가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면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달걀을 깨는 행위는 다를 게 없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내듯이 기획도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마음 끌어내기’다.
로그라인(log line)은 원래 항로를 뜻하는 뱃사람들의 단어였다. 로그라인은 플롯(plot)이라고도 불린다. 콘텐츠에서 기대감이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은 로그라인의 힘이다. 기획에서 로그라인은 한마디로 생각의 항로다.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쓰는 것이 기획안 작성의 원칙이다. 여러 번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쓸 때까지 쓰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만큼 썼다면, 이젠 지워보자. 더 이상 지울 게 없을 때까지 지워보면, 핵심만 남게 된다. 그것이 바로 로그라인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후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로그라인을 말하면 된다.
로그라인은 아이디어에 골격을 넣는 일이다.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 좋은 아이디어나 탁월한 아이디어도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 좋은 기획에서 착상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기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일종의 씨앗이다. 아이디어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 기획에서 로그라인이 중요한 것은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경로를 탐색하는 경로이고,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안을 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생각에 대한 끝없는 피드백이다. 머릿속에 있을 땐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던 아이디어와 논증 방식도 언어로 구조화해 눈앞에 문장으로 나타내면 비로소 어설픔이 여실히 드러난다. 기획은 생각을 언어로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며 완성하는 과정이다.
기획에서 스토리텔링은 크게 두 가지, 셋업(set up)과 급소 문구(punch line)로 구성된다. 기대와 긴장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앞에 깔아두는 것이 셋업이다. 몰입을 높이기 위해 맥락을 빚어내면서 미끼를 던지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대를 한 방에 해소하는 것이 급소 문구이다. 급소 문구는 마치 망치로 내려치듯이 반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기획안에서도 반전을 잘 사용하면 흥미롭게 구성할 수 있다. 기획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 행동을 ‘실은…’이라며 전달하는 것만으로 흥미로워진다. 훌륭한 기획자의 일은 적재적소의 로그라인을 배치하는 것이다. 기획안은 ‘무엇을’ 써야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언제’ 말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정보를 언제 주느냐의 눈치 게임이 기획안 작성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정보를 언제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기획자의 몫이다.
기획의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나 고통,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더불어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며 저마다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민감해진다. 그 차이를 갖고 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생각의 칸막이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발상으로 자유롭게 뻗을 수 있다.
기획자로서 배워야 하는 기본자세는 내가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해 보는 객관화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흥미로울까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겠다는 독단적인 자세만으로는 객관성을 갖출 수 없으며, 무슨 말을 하던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기획안의 타깃(target)이 귀담아듣는 훌륭한 기획안이 탄생한다. 기획안의 페르소나(persona)는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란 뜻이다. 페르소나는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 지향성을 길러준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기획에서 막중하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