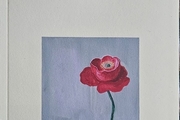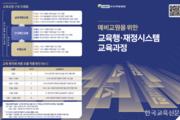21일 수원 숙지중학교(교장 조규선). 진정숙 보건교사는 학생들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작한 헌혈 광고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헌혈이 무슨 뜻일까요?”
“피를 나눠주는 거요.”
“맞아요. ‘헌신하다’ 할 때의 ‘헌’자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수혈은 갑자기 혈액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진 교사는 우리나라의 헌혈 실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대부분이 개인 헌혈자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 등 단체 헌혈자의 비중이 46%에 이른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7일분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재고가 약 3일분에 불과한 상태.
이어서 TV 시사프로그램 ‘비상! 혈액이 없다’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다. 아무리 헌혈을 하라고 권장해도 사람들이 피하기만 한다는 자원봉사자, 텅 빈 혈액저장고를 보여주는 적십자사의 직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라는 의사의 말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갔다. “일 년 내내 헌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 헌혈로 목숨을 구한 Rh- 혈액의 소아암 환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남자는 전체 체중의 약 8%, 여자는 약 7%를 혈액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몸무게로 자신의 혈액량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학생들은 수학문제를 계산하듯 학습지에 꼼꼼히 자신의 혈액량을 계산해 적었다.
“각자의 혈액량 중에서 10%는 여유로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눠줘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아요. 적십자사에서는 남자는 50㎏, 여자는 45㎏ 이상이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만 된다고 해서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는 만 16세부터 64세까지, 빈혈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겠죠?”
헌혈에 대해 새롭게 알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난 아이들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생님, 다른 나라 사람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꼭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만 받아야 하나요? 죽은 사람 피는 못 써요?”
“헌혈하다가 병이 옮지는 않나요?”
“헌혈은 자국민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혈액 속에는 그 나라만의 풍토병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멎으면 혈액도 살 수 없어서 굳어버리겠죠? 그럼 헌혈도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싫어서, 바늘이 무서워서 헌혈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금방 새로운 피를 만들어 낸답니다. 멸균된 바늘이기 때문에 병을 옮길 위험도 전혀 없고요. 혈액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닷새 정도만 쓸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헌혈은 5분이면 끝난답니다. 5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그동안 헌혈 같은 걸 왜 할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많이 반성했어요.”
“수술을 못하는 환자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자기도 수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혈액이 부족한지 몰랐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하지만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할 거예요.”
진 교사는 “나이가 안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줘도 어떻게 헌혈하면 되냐며 조르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라며 “계기수업으로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제작된 수업안을 홈페이지(www.kfta.or.kr)에 올려 일선 학교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교총과 대한적십자사는 수업자료를 CD로 제작해 다음달쯤 전국 초·중·고에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