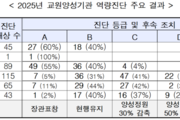선생님! 실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리운 이름입니다. 같은 교단에 있으면서도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란 호칭을 듣기만 했지 정작 나만의 선생님께는 소홀하지 않았던지…. 아마도 저 같은 제자가 있어 점점 엷어져가는 사제간의 정을 걱정하는 세태가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그저 민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간난신고(艱難辛苦)의 20여 년 전,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한 채 고3으로 진급하던 날, 담임선생님을 배정받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교내에서 '3대 독사'의 한 분으로 지목될 만큼 명성이 자자했던 선생님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들은 거의 사색(死色)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입시보다도 당장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저희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여 교실로 들어오셨고, 저녁에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1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퇴근길에 오르셨지요. 피곤에 지쳐 목이 잠겨도 혼신을 다해 열강하시는 선생님의 모습 앞에서 저희들은 잠시도 한 눈을 팔수가 없었답니다.
지금은 학교 급식실에서 갓 지어낸 따뜻한 밥과 각종 영양까지 고려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가방에 도시락 두 개쯤 넣고 다니던 것은 흔한 풍경이었지요. 가끔 반찬통이 엎어져 책이 김치 국물에 붉게 물들고 냄새가 나는 불편도 따랐으나 도시락을 먹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 제자들이 안쓰러웠던지 직접 끓여 오신 보리차를 일일이 따라주시던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돌이켜보면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수능 문제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명문 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느냐가 훌륭한 교사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생을 멀리 보고 삶의 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승의 의미는 점점 퇴색한 채,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만 존재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제자들을 자식처럼 열성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굳이 박노해 시인이 말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 구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만이 교사의 존재 이유라는 최면(催眠)을 걸어보기도 한답니다.
엄혹한 시절,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곁길로 빠지려 할 때 엄하게 꾸짖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다 해도 존경하여 따르고 싶은 스승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학교 교정엔 등나무 꽃이 만개했습니다. 알싸한 향기에 끌려 수많은 벌들이 꿀을 따려고 꽃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에 대하여 자문해 봅니다. 꽃을 찾아 날아드는 벌처럼 선생님의 향기에 취해 가르침을 받고자하는 제자들이 단 한명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단에 서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선생님,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간은 저희들이 선생님의 정원에 꽃과 나비가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 이 글은 남대전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장래식 선생님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