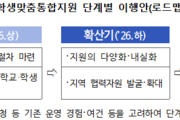중간고사 첫 날. 조회를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자 그 분위기가 여느 때와 달랐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이들은 오늘 치를 과목의 시험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잠깐 동안 아이들에게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난 뒤, 아이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일체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교실에서 나왔다.
"자, 휴대폰 안 낸 사람 없지? 지금 휴대폰을 내지 않은 사람은 소지만 해도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알겠지?"
그런데 교실 문을 열고 나가자 우리 반 한 여학생이 내 뒤를 따라오며 말을 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죽어 있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요?"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다. 내민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죄송해요. 깜박 잊고 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부정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왠지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제자를 믿지 못하고 매 시험 때마다 아이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된다는 현실에 불쾌감이 들기까지 했다.
잘못된 관행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만 두터워지고 나아가 믿음이 깨져 불신만 더 쌓여간다면 미래 우리의 교단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치르면서 무척이나 긴장되어 있는 아이들이다. 감독하는 선생님들의 눈초리에 아이들은 깜짝 놀라곤 한다.
앞으로 아이들은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그 자체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감시를 받으며 시험을 보는 것 그 자체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아이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