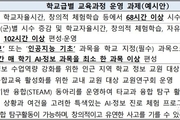요즘 뉴스를 보면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반지는 세 돈, 목걸이는 네 돈’이라는 말을 한다. 간혹 ‘서 돈, 넉 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세 돈, 네 돈’이라고 한다.
이는 표준어 규정 제17항에 보면,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해 ‘네/너’ 대신에 ‘너[四]/넉[四]’을 쓴다.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넉 냥, 넉 되, 넉 섬, 넉 자’가 그 예다.
‘서[三]/석[三]’도 마찬가지다. ‘세 돈/세 냥’이라고 하지 않고, ‘서 돈, 서 말, 서 발, 서 푼/석 냥, 석 되, 석 섬, 석 자’라고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재 표준어 규정대로 한다면 금을 세는 단위는 ‘너 돈/서 돈’만 된다. ‘네 돈’과 ‘세 돈’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문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면서도 언제는 ‘너/서’를 쓰고, 또 언제는 ‘넉/석’을 쓰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서 첫소리가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 앞에서는 ‘석/넉’을 쓴다고 한다. 그 예로 ‘석 냥, 석 달, 석 섬, 넉 자’를 든다. 그리고 ‘ㅁ, ㅂ, ㅍ’ 등으로 시작하는 수량의 단위 명사는 ‘서/너’를 사용하여 ‘서 말, 서 발, 서 푼’ 또는 ‘너 말, 너 발, 너 푼’으로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도 오히려 혼란만 더한다. 이보다는 표준어 규정 17항을 외우는 편이 더 낫다. 즉 이것은 규칙성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서 관형사 ‘석’을 ‘냥’, ‘되’, ‘섬’, ‘자’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전에서는 관형사가 ‘냥’, ‘되’, ‘섬’, ‘자’의 앞에만 쓰이는 것처럼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구나 속담을 보면 그 쓰임이 다양했다.
○ 서 홉에도 참견 닷 홉에도 참견(서 홉을 되는데도 많다 적다하고 다섯 홉을 되는데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으로, 부질없이 아무 일에나 참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 잔이요, 잘못 서면 뺨이 석 대
○ 이름 석 자(字)
○ 석 달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끝마무리가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넉 달 가뭄에도 하루만 더 개었으면 한다.(오래 가물어서 아무리 기다리던 비일지라도 무슨 일을 치르려면 그 비 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
위에서 보듯 ‘홉, 잔, 자(字), 달’에도 ‘서/석/넉’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종이 석/넉 장, 차 석/넉 대, (바둑에서)석/넉 집, (농구 경기에서)석 점 슛’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쓰임의 범위가 매우 좁아졌다. 예컨대 노년층은 ‘석 달이나 남았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은 ‘세 달이나 남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종이 세/네 장, 차 세/네 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명사 사이에 ‘서/너’나 ‘석/넉’을 써야 하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보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서/너’나 ‘석/넉’의 복잡한 선택이 쓰임을 멀게 한다. 편리한 어법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는 ‘세’나 ‘네’를 붙이는 단순성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또, 2007년 7월부터 정부에서 비법정단위 사용을 금지한 것도 한몫을 했다. 이제는 길이의 자, 넓이를 의미하는 평, 부피를 뜻하는 홉·되·말·석(섬), 무게를 표시하는 돈·냥 등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말에 쓰는 수 관형사 표현에서 전통적인 어법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물론 전통적인 단위 표현을 지양하고 표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입에 익어 온 전통적 어법은 유지해야 한다. 현재 표준어 규정에 의거해 ‘금 너/서 돈, 쌀 넉/석 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앞에 예를 든 관용구와 속담도 우리 언어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어법이다.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