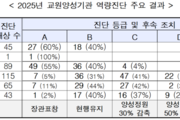중학교 때 목련을 소재로 시를 쓴 적이 있다. 방과 후 2층 교실에 혼자 남아 화단을 내려다보면 자주색 목련이 보였다. 털로 덮인 겨울눈을 깨고 자주색 목련꽃이 올라와 개화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다. 그걸 관찰해 ‘뾰족이 찌르더니 / 어느새 피가 맺힌 목련입니다’라는 시를 쓴 기억이 있다. 마무리는 ‘고운 내 물감을 / 뿌리 옆에 고이 묻어 / 화려한 앞날을 기다리고 싶습니다’라고 쓴 것 같다. 시로 써본 소재여서인지 지금도 목련을 보면 친근감을 느낀다.
필자가 평소 관심을 갖는 일은 꽃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을 찾는 것이다. 그 결과물로 ‘문학 속에 핀 꽃들’이라는 책을 낸 적도 있다. 우리 소설에서 목련이 주요 소재 또는 상징으로 나오는 작품도 꼭 찾고 싶었다. 그런데 필자가 목련에 대해 가장 문학적인 묘사를 만난 것은 소설이 아니라 김훈 작가의 에세이에서였다.
에세이집 <자전거여행>에서 목련이 피고 질 때를 묘사한 글은 압권이다. 목련이 피는 모습을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라고 했다. 이어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루하고 가장 참혹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목련이 지고 나면 봄은 다 간 것”이라고 했다.
김훈은 꽃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 <내 젊은 날의 숲> 작가의 말에서 “풍경의 안쪽에서 말들이 돋아나기를 바라며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본 세상의 풍경”을 썼다고 했다. 목련이 피고 지는 것도 ‘눈이 아프도록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같은 묘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김훈이 쓴 대로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활짝 벌어지지 않는 것은 백목련의 특징이기도 하다.
백목련에 이름을 빼앗긴 진짜 목련
목련(木蓮)이라는 이름은 연꽃 같은 꽃이 피는 나무라고 붙인 것이다. 봄이면 온갖 꽃들이 부산하게 피어나지만, 겨우내 잘 보이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장 위를 하얗게 뒤덮는 목련이 피어야 진짜 봄이 온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의 공원이나 화단에서 흔히 보는 목련의 정식 이름은 백목련이다. 백목련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자라긴 했지만, 중국에서 들여와 관상용으로 가꾼 것이다. 이름이 ‘목련’인 진짜 목련은 따로 있다. 더구나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우리 나무다.

진짜 목련이 중국에서 들어온 백목련에 이름을 빼앗긴 셈이니 억울할 법하다. 더구나 일본에서 부르는 대로 열매가 주먹을 닮았다고 붙인 이름인 ‘고부시(こぶし, 주먹) 목련’이라고도 부르니 더욱 서러울 것 같다. 백목련은 흔하지만 목련은 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목련은 백목련보다 일찍 피고, 꽃잎은 좀 더 가늘고, 꽃 크기는 더 작다. 백목련은 원래 꽃잎이 6장이지만, 3장의 꽃받침이 꽃잎처럼 변해 9장처럼 보인다. 목련은 6~9장이다. 또 백목련은 꽃잎을 오므리고 있지만, 목련은 꽃잎이 활짝 벌어지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목련에는 바깥쪽 꽃잎 아래쪽에 붉은 줄이 나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자주색 꽃이 피는 목련도 두 종류다. 꽃잎 안팎이 모두 자주색인 목련을 자목련, 바깥쪽은 자주색인데 안쪽은 흰색인 목련은 자주목련이라 부른다. 필자가 중학교 때 본 목련은 ‘피가 맺힌’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자목련이었을 것 같다. 그 밖에도 다양한 목련 품종을 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알기도 어려워 그 이상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윽한 꽃향기가 일품인 함박꽃나무
여름이 시작할 무렵인 5~6월 산에 가면 목련처럼 생긴 싱그러운 꽃을 볼 수 있다. 정식 이름은 함박꽃나무지만 흔히 산목련이라고 부른다. 목련은 위를 향해 피지만, 함박꽃나무 꽃은 아래를 향해 피는 점이 다르다. 무엇보다 함박꽃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니 목련과 혼동할 염려는 없다.
함박꽃나무 꽃은 맑고도 그윽한 꽃향기가 일품이다. 말 그대로 청향(淸香)이다.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근처에 함박꽃나무가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강하다. 함박꽃나무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다.
함박꽃나무를 설명할 때 이 나무 꽃이 북한의 국화(國花)라는 것을 빠뜨릴 수 없겠다. 북한에서는 이 꽃을 ‘목란(木蘭)’이라고 부른다. 김일성이 이 꽃을 칭찬한 것을 계기로 1991년 국화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꽃을 국화로 지정했다고 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노란 꽃이 피는 일본목련, 꽃의 지름이 20㎝까지도 자라는 상록성 태산목 등도 목련 가족이다. 일본목련은 이름처럼 일본에서 들여온 나무인데 씨앗이 퍼져 마을 주변 산자락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목련이 필 무렵 눈여겨보면, 꽃봉오리들이 일제히 북쪽을 향한 것을 볼 수 있다. 옛 선비들은 이를 두고 한결같이 임금님이 있는 북쪽을 바라본다 하여 ‘북향(北向)화’라 부르며 칭송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백목련 꽃눈이 워낙 커서 남쪽과 북쪽 부분이 받는 햇볕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쪽 부분이 햇볕을 더 받아 더 많이 자라면서 북쪽으로 휘어지는 것이다.
목련의 아름다움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곳은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이다. 4~5월 이곳은 말 그대로 목련 천국이다. 천리포수목원은 ‘600품종 이상의 목련을 갖춘 수목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자랑하고 있다. 국제수목학회(IDS)가 2000년 이 수목원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한 것도 다양한 목련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천리포수목원은 올해 4월 9~30일 목련 축제를 연다고 한다. 노란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깔의 목련은 물론 별목련, 큰별목련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목련을 볼 수 있다. 당연히 토종 목련도 밀러가든 작은 연못 옆에서 볼 수 있다. 가족사진 중에서 가장 맘에 들어 걸어둔 것은 천리포수목원 연분홍 목련 앞에서 찍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