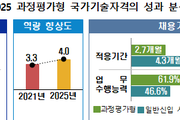며칠전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가 있었다. 이른바 ‘스크린 쿼터’였다.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영화상영관이 일정 기간 한국 영화를 의무 상영토록 한 제도로 1967년 도입됐다. 처음에는 2개월에 1편, 1년에 6편, 연 90일 이상 상영토록 했으나 70년 4개월에 1편, 1년에 3편, 연 30일로 완화됐다. 73년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다가 85년 외화 수입이 자유화하면서 5분의 2로 강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스크린 쿼터 제도가 유지되는 쪽으로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스크린 쿼터 축소에 맞서 인기 영화배우들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1인 시위를 했던 장면과 달리 그늘속에 가려진 위안부 할머니들의 외로운 수요시위를 말하기 위함이다.
아다시피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1인 시위에는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배우들인 올드보이의 최민식, 왕의 남자의 이준기, 국민 여동생이라는 문근영 등이 총출동하여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하였다. 시민들도 스크린 쿼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기 연예인을 보기위해 장사진을 이룬채 사진을 찍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며 그들의 행동에 동조를 표하기도 하였다. 내외신 기자들도 수백명이 몰려와 사진을 찍고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매주 수요일 12시에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외롭게 한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일본에서 몇몇 단체와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그 할머니들의 싸움이 조금은 덜 외롭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두가지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낄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고 볼만한 것이 있으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부나비처럼 맹목적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증하고 심층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란 사회의 공기가 오히려 특종보도식으로 경쟁적으로만 보도하는 촌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스크린 쿼터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싸우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에 나부터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몇 글자를 써봤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경제 불황의 그늘속에서 양극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것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팍팍한 세상에 인간과 인간끼리의 끈끈한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