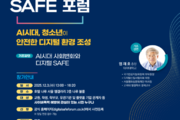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세계 질서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등장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지만 모두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럽, 이슬람, 중국, 미국에서 세워진 네 개의 거대한 세계 질서는 각각 자신의 문명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원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겼다.
현재 세계 질서로 통하는 것은 약 400년 전 유럽의 베스트팔렌에서 체결된 조약에서 기원한다.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세력의 충돌로 시작한 30년전쟁은 중부 유럽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희생된 뒤에야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참전국들은 서로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통해 서로의 야심을 억제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하여 주권국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할과 다양성이라는 질서의 개념을 처음에는 유럽에서, 이후에는 식민지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로 퍼뜨렸다.
유럽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황제가 천하를 지배하는 정치적·문화적 위계질서를 수천 년간 유지했다. ‘세계의 중심’인 중국으로부터 한문의 숙달 정도와 문화제도에 따라 세계를 다양한 등급의 ‘야만인’으로 분류했다. 한편, 유럽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슬람은 자신들이 신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지배체제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여러 대륙에 걸쳐 전례 없는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서양 건너 신세계에서는 민주 원칙의 확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미국식 질서가 생겨났다.
주요국가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개괄하여 보면 현대는 베스트팔렌조약 당시의 상황만큼이나 세계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위기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헤게모니 국가 교체기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모든 질서는 힘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할 일의 핵심이다. 힘만 계산하면 모든 의견 충돌이 힘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힘의 균형을 무시하는 도덕적 금지는 무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질서는 홀로 행동하는 한 국가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에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근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과 맞물리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나 한국의 약진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정은 초조할 것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발끈해 과잉 대응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숙한 대일 외교가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교역액의 17.6%, 외환보유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은 소중하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3국 간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량을 3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세계질서를 세우려면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실을 인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체제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치의 중심에 국가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