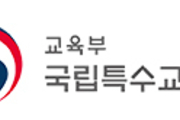인구 구조는 국가의 장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구구조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통계청은 지난 9월 7일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연령의 중위값을 나타내는 중위연령은 2010년 38.2세였지만 지난해 41.2세로 3.0세 늘었다. 중위연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주요 국가 중위연령을 비교하면 일본 46.5세, 독일 46.5세, 영국 43.4세 등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였다. 프랑스(41.1세), 미국(37.8세), 중국(36.8세), 인도(27.3세)는 한국 보다 젊은 국가로 꼽혔다.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5년 전보다 2.7% 늘어 5107만명에 달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히 늘어난 셈이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0~2015년 72만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21만명이나 늘었다. 인구 구조는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30~40대 인구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구조를 보였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2010년 대비 0.3% 포인트 늘어 지난해 전체 49.5% 차지했다.
지난 2010~2015년 한국의 인구 변화는 생산연령인구의 정체기를 맞고 고령인구는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2.6%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72.9%로 2010년 보다 0.1%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10년 보다 97만명 감소하면서 저출산 여파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1985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유소년 인구는 518만명 감소했지만 고령인구는 482만명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초과하는 남초 현상은 지속됐다. 지난해 여성 인구는 전체 49.9%, 남성은 50.1%를 차지했다. 인구 수로 보면 남자가 2561만명, 여자가 2546만명이었는데 2010년 대비 남자는 2.7%, 여자는 2.8% 증가했다. 1㎢ 안에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는 인구밀도는 지난해 509명으로 2010년 497명 보다 12명 늘었다. 한국은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방글라데시(1237명/㎢), 대만(649명/㎢)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인구가 조밀한 국가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구 증가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2527만명으로 전체 49.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보다 0.3%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만 해도 46.3%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인구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울 19.4%, 부산 6.8%, 경남 6.5%가 뒤를 이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0%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는 지난 2010년의 경우 강원, 경북, 충남, 전북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부산, 충북, 제주가 새롭게 들어갔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10년 모든 지역이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기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넘는 상태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전남은 지난해 21.1%에 이르렀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 지자체는 전남 고흥 38.5%, 경북 의성 38.2%, 경북 군위 37.5% 순이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은 시군구 지자체는 울산 북구 6.4%, 대전 유성 6.9% 등 2곳 뿐이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7년 뒤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접한 전북에서도 30년 안에 전북 도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빠져 나가 노인들만 남은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노인들이 숨지고 나면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열매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떨어진 활력만큼이나 경제성장률은 둔화된다. 돈을 빌려 투자하려는 수요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금리가 점차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 이 세 단어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복지가 어느 정도 완성된 국가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저성장, 저금리 그리고 고령화의 위험과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위험은 그 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독일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대신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하여 노인들의 경우는 매우 힘든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