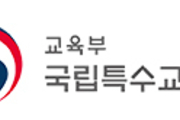서울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거리가 있다. 그곳이 바로 '홍대 거리'이다. 그곳에 커피숍을 내 청년이 최근 문을 닫았다. 장사가 반짝 잘 되는 걸 본 건물 주인이 월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그 부근에 있던 포장마차도 문을 닫았다. 손님이 없어서였다. 집주인의 횡포로, 포장마차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 악화로 문 닫은 것이다. 이처럼 제조업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로 신음하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 행위다. 대기업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일이 다반사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혼란스런 것이 오늘의 한국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문제가 아니다. 실력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잘 관리하여야 할 관리들의 무책임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성장 궤도에서 선진국을 따라 하는 추격형 성장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 상당히 따라잡고 나니 경쟁이 만만치 않다. 그들은 정보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저 멀리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어려움에 세계적 대불황이 겹쳐 한국경제는 2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금리·통화량·재정지출·세금 등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으로 증명됐다.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이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를 점검하여 봐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의 시선은 모두 그리스로 쏠려 있었다. 막대한 국가 부채에 허덕이던 그리스에 채무불이행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그렉시트)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국가는 흔들렸다. 그리스 경제위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스토리텔링의 보물창고’ 그리스가 어쩌다 이런 위기에 빠졌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가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위기를 당하면 쉽게 일어서기는 매우 힘들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산하고 전파한 독창적인 문명은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현대 국가의 보편적 가치 관념과 문화예술의 토대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과거의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문명의 스승인 셈이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개념을 창안한 이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다. 보편적 가치와 사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그리스인들에게 정신적 빚을 지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테네인들이 그렇게 희구하던 시민권의 참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현실에서 시민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날 일정한 나이만 되면 자동적으로 성인과 국민이 된다. 그러니 국가와 사회의 공동 가치에 대한 명확한 관념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몰시민적 국민’이 된 이들은 유독 자신의 권리 실현에만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나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 공동체 덕목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했다. 그는 책 '국가'에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즘 같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기업가, 판사, 검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는 국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가고 있다.도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는 참다운 안목이 길러지고, 나아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문명을 창출해낸 원동력은 교육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전인적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성을 함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진지한 성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예술, 건축, 철학과 문학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여느 문명과는 확실히 다른 무한한 상상력과 인문학적 영감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이 성공과 성취로 일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 사다리만을 만드는 지도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참된 지도자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