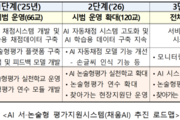건축가 안도 다다오. 건축을 잘 모르는 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이름이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에 빛나는 거장이다. 특히 그의 작품들은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 양식의 시초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프로를 꿈꾸던 아마추어 권투선수였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가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건축분야에서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자기 객관화와 전략적 포기에 능했던 것일까. 한창 권투선수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던 어느 날, 프로선수와 스파링을 해본 후 본인에게 성공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권투선수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
뚝심으로 완성한 성공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현대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집에 매료되고 그의 작품을 실제로 보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다. 건축이라는 세계로의 입문을 결심한 그는 귀국 후 건축가로서의 길을 묵묵히 걷게 되는데 조그마한 집들을 설계하며 내공을 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아주 특이한 집을,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집을 지어냄으로써 유명세를 타게 된다.
안도 다다오를 세상에 알리게 된 그 작품은 폭과 너비가 좁은 박스형 주택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집 중앙에 하늘을 향해 뻥 뚫린 정원을 품고 있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정원에 내어 준 면적 때문에 방과 거실은 작아졌고 여름에는 햇볕이 들어와 더웠으며 겨울에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니 난방비가 더 들었다. 게다가 비라도 오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며 우산을 받쳐 들어야만 했다. 여러모로 살기에 불편한 집이다.
설계도를 본 집주인의 반발은 당연했다. 아름답고 참신하기는 해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집에 살게 된 판에 ‘오냐 그렇게 지어달라’는 집주인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안도 다다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인간과 그 주거지를 자연의 일부로 해석하여 집도 사람도 자연에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로 집주인을 설득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관철시켰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운 것이 정상이고, 겨울에는 겨울답게 추워야 합당하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즐기라는 것이다.
안도 다다오는 그 전까지의 건축가와는 달랐다. 집주인이 원하는 효율성으로 집약된 성냥갑 같은 ‘그렇고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집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본인 고유의 스타일과 건축 철학을 고수한 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고집과 소신은 성공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무난하고 둥글둥글한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겠으나 고만고만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특이한 세계관 인정해야
그동안의 교직 경험을 되돌아보건데, 늘 한 반에 한둘은 유난히 고집 세고 특이한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다. 선생님의 혼을 쏙 빼놓는 사건 사고는 그들이 도맡아 일으키곤 한다. 반 아이들 전체에게 갈 에너지가 고집쟁이 한두 아이에게 몽땅 쏠리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나 그들의 독특한 사고와 고집이 훗날 안도 다다오의 성공을 이끌어낸 그 뚝심처럼 발휘될지 누가 알 것인가.
오늘도 선생님을 긴장케 만드는 그 아이들을 미워만 할 게 아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기억하는가. 그는 존경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우직하고 고집스레 작품활동을 했다하지 않는가. 아이들의 그런 고집들이 언젠가 빛나는 창의성의 모습으로 발현되어 괄목상대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