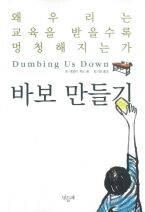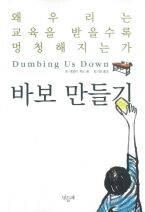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다.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라는 교육 체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1806년 프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에 패한 뒤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대프러시아 통합을 위해 의무 학교교육 제도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20년 뒤, 1826년에 프러시아는 복종할 줄 아는 신민(臣民)을 기르기 위해 국민 학교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를 유럽·미국·일본이 받아들였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렇듯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교육을 ‘바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책이 있다. 26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존 테일러 개토라는 미국의 교육 운동가가 쓴 ‘바보 만들기’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국가 혹은 지배 계층이 유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단순하고도 힘든 노동을 견뎌낼 줄 아는 노동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관료 등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결국 바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바보로 알고 좌절하는 수많은 실패자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진짜 바보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신랄한 통찰이다.
“학교에서의 훈련을 교육이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조직은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진 시간의 절반을 가둬놓음으로써,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을 저희들끼리만 묶어놓음으로써, 일의 시작과 끝을 종소리로 통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게토는 이런 학교 제도의 특징이 교도소의 규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포함한 ‘교사의 일곱 가지 죄’를 언급한다. 혼란, 교실에 갇혀 있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 즉 정서적·지적으로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으며, 자기 판단 기준 없이 늘 혼란스럽고, 교실 밖·학교 밖과 소통할 줄 모르며, 학생들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교사의 죄’라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에게 몰개성을 강요하고 명령을 따르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사들 탓만은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채소에 등급 매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리고 그밖에도 수십 가지 천박하고 우매한 방법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사회의 생명력을 훔쳐내고 추악한 기계론만을 심어놓습니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인격을 손상당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정가들도, 학부모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는 교사 역시 학교 제도의 피해자라고 말한다.
게토의 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단호하다. “미치광이 학교와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없는 한 학교라는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많이 허락하고,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홀로 있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격의 견학과 견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받을수록 멍청해지는 바보 만들기’에 일조하는 ‘죄’를 범할 것인지, 삶 속으로 파고드는 교육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 지는, 여전히 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