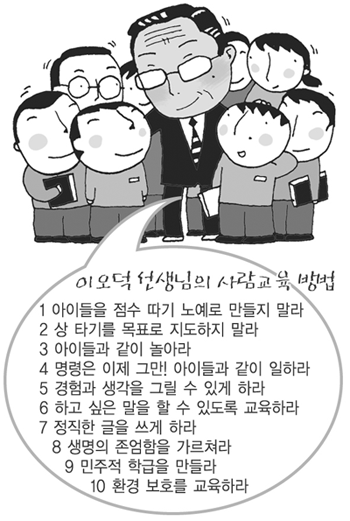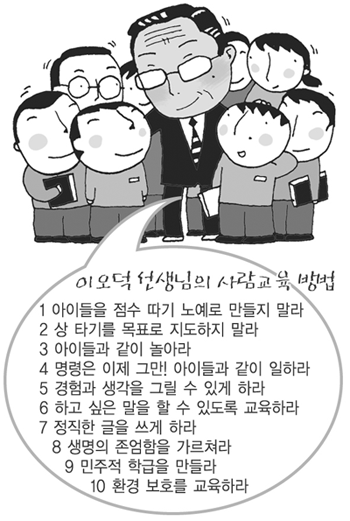
"42년의 교직을 어쩌면 이렇게 미련도 한 올 없이 헌 옷 벗어 던지듯 훌 훌 벗어던지는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딴 곳에다 꿈을 두었던가? 아니다.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내 사랑은 아직도 저 총총한 눈망울 반짝이는 아이들한테 가 있다. 내 꿈은 저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 삶은 그대로 감옥살이 42년! 이제야 나는 풀어 놓인 한 사람의 인간, 인간이 되었다."
이오덕 선생은 자신의 퇴임식 날 아침에 이렇게 썼다. 왜 그랬을까. 선생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을 마음껏 가르쳐보고 싶은데도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행정 환경을 가장 큰 까닭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를 선생 스스로가 행정 환경이라는 등살에 못 이겨 코를 꿰어 끌려 다니다시피 살며 가르치는 것, 오로지 성적 높이기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학부형들을 지목했다.
그럼에도 선생이 굳이 그 옥살이 같은 교육 텃밭을 42년이나 떠날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역시 교육이 아니고는 우리 사회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사회로 될 수가 없고, 아이들만이 우리 희망이란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아이들의 세계-잘못된 교육 때문에 하루하루 병들어 가는 아이들의 세계를 살리지 않고는 도무지 참을 수 없었기 때문” 이었다. 선생은 그렇게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평생 좁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아이들을 믿어야 한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된다. 아이들을 믿지 않고서는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서 말이다.
선생은 “온갖 잡동사니 지식을 경쟁으로 외우게 하고 있는 학교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했다. 선생은 바른 교육은 첫째 모든 교육을 삶을 부대끼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둘째 모든 교육이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하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아이들의 삶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삶을 배우는 것보다 더 값진 가르침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숱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삶을 가르치고 삶을 배우는 교육,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다.
평생토록 교직에 몸을 담고 살아 왔지만 정작 자신은 선생 노릇을 한 적이 없다는 이오덕 선생님. “나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른바 출세란 것을 해서 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든지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웃과 정을 나누면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넉넉한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 내가 교단에 섰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203쪽)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