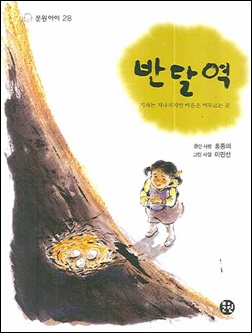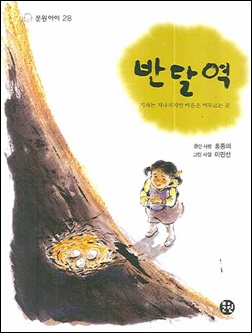
사라져가는 것은 노을처럼 아름답다. 사라진 뒤의 애잔한 흔적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아픔이 되기도 한다. 다시 아픔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추억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서 늘 숨을 쉰다.
간이역. 기차가 멈춰버린 간이역도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애잔한 추억을 남기고 간 것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라진다는 것은 추억 이전의 쓸쓸함이다. 늦가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쓸쓸함이 묻어있다. 또한 아픔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 얼마 후면 문을 닫아야 하는 간이역인 ‘반달역’에도 이런 아픔과 쓸쓸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부자도 아니다. 젊은이의 힘참도 없다. 간이역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죽어가는 그림이 할아버지와 그림이, 반달역을 끝까지 지키는 반달역 아저씨, 늘 술에 취해 사는 늙은 총각인 순명이 아저씨가 반달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다.
그림이는 갓난아기 때 반달역에 버려진 아이 이름이다. 버려질 때 종이에 아기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림이’이란 이름으로 불렀다. 그 그림이을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다. 할아버진 그림이를 키우며 열아홉에 칙칙한 시골 동네가 싫다고 떠나가 소식조차 없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림이는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도 없다고 놀림을 받기도 한다. 아이들이 때론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거지라고 놀리지만 마음이 깊은 그림인 그걸로 울거나 할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지도 않는다. 할아버지 앞에선 어린양을 피우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 한다.
그런데 그림이는 할아버지가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른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할아버진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들을 찾으려 애쓰지만 찾지 못한다. 한 달 후면 문을 닫는 ‘반달역’처럼 할아버지 운명도 다하는 현실. 그 쓸쓸함과 슬픔을 반달역 아저씨와 순명이 아저씨가 나누어 가진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면 반달역 아저씨가 그림이를 대신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림이는 그런 사실을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반달역은 한 달이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모두들 빠른 것만 좋아합니다.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때 장이 설 정도로 반달역 주변 동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모두들 도시로 떠났습니다.”
요즘 간이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큰 역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인지 모른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라져가는 것이 어디 간이역뿐만 일까.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있다.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간이역에 기차가 멈추는 것처럼 시골 동네엔 젊은 사람이 멈추고,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어버렸다.
이런 시골과 간이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늙고 힘없는 사람들이다. 반달역 아저씨처럼 말이다.
“<반달역>은 달의 반쪽만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둥근 보름달을 채워가는 따뜻한 이야기다.”
사실 동화 속엔 큰 울림이나 큰 슬픔 또는 아픔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러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가슴이 나도 모르게 다사로워짐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이슬이 마음에 맺히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이야기 중간 중간에 그려진 삽화 속의 그림이가 웅크려 앉아 있는 모습에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절로 든다.
반달역. 기차가 반달처럼 휘돌아 오다 허리를 쑥 펴고 오다 닿는 곳. 철로 가에 측백나무가 초록빛 울타리로 서있고, 이름 모를 들꽃과 키 작은 코스모스가 어쩌다 내리는 사람들을 맞아주는 곳.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조금은 쓸쓸하지만 정겨운 이런 그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이와 할아버지, 반달역 아저씨의 된장 같은 정도 느낄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어떤 것인가도 알 수 있다. 반달역에 가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