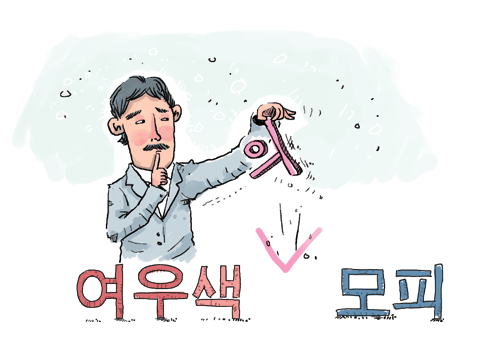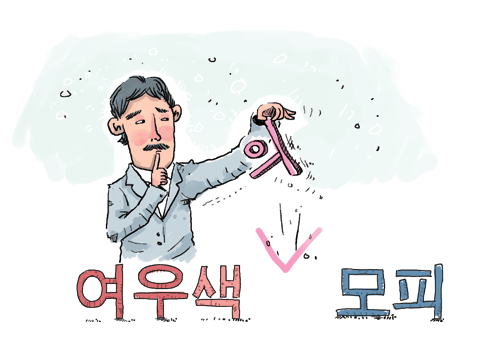
글말투에서도 불필요한 ‘의’는 빼버리자지난 호 글에서, 입말에서 ‘의’가 생략되기 쉬운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글말에서 ‘의’의 생략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 제시한 표현에서 ‘의’의 쓰임을 주목해보자.
회색빛의 구름 한 덩이 : 회색빛 구름 한 덩이
여우색의 모피 : 여우색 모피
16평형의 원룸 : 16평형의 원룸
여러 가지의 논의 : 여러 가지 논의
노랑 머리의 청년 : 노랑 머리 청년
여섯 가지의 재료 : 여섯 가지 재료
대규모의 조사단 : 대규모 조사단
대용량의 김치냉장고 : 대용량 김치냉장고
우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자동차의 가격이 올랐다 :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모든 경우에 왼쪽 표현에 들어 있는 ‘의’는 불필요해 보인다. 입말투에서 ‘의’를 자연스럽게 생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런 ‘의’는 글말투에서도 생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굳이 ‘의’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도 앞에 자리한 명사 뒤에 ‘의’를 습관적으로 쓴 문장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를 강조하듯이 집어넣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된다. 하나는 글말투가 본디 형식을 중시한다는 점을 의식한 탓일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영어 ‘of’ 혹은 일본어 ‘の’ 가 빈번하게 쓰이면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를 뚜렷이 제시하는 번역투 문체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기도 하다.
‘의’를 생략하기 쉬운 이유는, 본래 한국어가 명사와 명사가 어우러져 아주 손쉽게 복합명사를 이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명사가 저절로 뒤의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를 취하는데, 무엇 하러 굳이 ‘의’라는 거추장스러운 조사를 끼워 넣겠는가.
‘한 송이의 국화꽃’이 말하고 싶은 것대다수 한국어사용자들의 귀에 익숙한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한 송이 국화꽃’이나 ‘국화꽃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의 국화꽃’이라고 했을까.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이 세 가지 표현의 차이를 음미해보자. 그러면 역시 ‘한 송이 국화꽃’이나 ‘국화꽃 한 송이’보다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한 송이’를 한결 강조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특별한 시적 의도를 담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데도 ‘의’를 넣어서 어색한 표현을 만드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질문’이라 해도 될 것을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의’를 집어넣는 것은 아마도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의’의 올바른 쓰임을 의식하지 않은, 둔한 글쓰기를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다음 표현들을 살펴보자.
하나의 침대, 두 명의 무장간첩, 20여 명의 관객, 다수의 국민, 대다수의 회원들, 여러 명의 구경꾼들, 단 하나의 이야기, 대박의 환상, 자신과의 약속, 한마디의 발언, 열 분 정도의 회원, 몇 개의 대문, 석 잔의 커피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의 쓰임새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의’를 무분별하게 씀으로써 표현의 경제성과 의미전달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 좀더 예민한 촉수를 내밀고 ‘의’를 다루어야겠다.
‘의’를 넣으면 앞뒤 단어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한국의 자연’을 ‘한국 자연’이라고 하면 어색한데, ‘한국의 사회’는 ‘한국 사회’로 줄이는 것이 훨씬 깔끔하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한국의 정부/한국 정부’, ‘한국의 풍습/한국 풍습’처럼 어떤 것은 ‘의’를 넣어야만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는 한편, 어떤 것은 ‘의’가 없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쪽이 더 매끄럽게 느껴진다.
‘의’는 자신이 연결하는 두 낱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한국 자연’이 복합명사로서 아직 낯선 데 비해 ‘한국 사회’가 한 단위의 명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국’과 ‘사회’, ‘자연’이 맺는 관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인류’, ‘사회’, ‘발전’이라는 세 낱말이 있을 때, ‘의’를 써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의’를 다 쓰자면 ‘인류의 사회의 발전’이라 해야 할 테지만, 보통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고 쓸 것이다. ‘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적절한 곳에 ‘의’를 써야 한다. 만약 이것을 ‘인류의 사회 발전’이라고 한다면 의미를 금방 알아채기가 힐들 것이기 때문이다. ‘의’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한편, ‘의’의 생략은 두 단어의 거리를 좁혀준다. 이렇게 거리가 좁아진 두 단어는 복합명사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
나아가 ‘인류의 사회의 발전’으로 쓰면, ‘의’가 한꺼번에 둘이나 들어가 매끄럽지 못한 한국어 표현이 되어버린다. ‘인류 사회’라는 두 단어를 마치 복합명사처럼 취급함으로써 적절한 의미전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통 문화의 보존’, ‘국민 복지의 실현’, ‘통일 정책의 전환’ 등이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것을 ‘전통의 문화 보존’, ‘국민의 복지 실현’, ‘통일의 정책 전환’이라고 한다면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일본어투 조사를 남용한 예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 문장이 근대에 성립한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입말과 글말 사이 : 와/과 : (이)랑 : 하고> 편에서 기술한 바 있다. 그때 한국어에 미친 일본어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거니와, ‘의’야말로 일본어의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조사의 쓰임이 특히 거슬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러한 조사에는 ‘의’가 붙어 있다. 우선 예문을 살펴보자.
나라 전체에 민주주의에의 갈망이 넘쳐나고 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와의 만남은 겨우 15년이 될까 말까 한 짧은 기간이다.이런 표현들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방법으로, 문맥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넣어주어야 할 경우, 체언을 서술어로 고쳐야 할 경우, 조사를 바꾸어야 할 경우 등이 있다. 위 예문들을 한국어의 특성에 맞게 고쳐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 전체에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겨우 15년이 될까 말까 한 짧은 기간이다.‘의’를 잘 활용해야 한국어의 특성이 산다‘나의 살던 고향’을 굳이 예로 끌어오지 않더라도, ‘의’ 얘기만 나오면 일본어투 문제를 비껴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일본어 문형에서는 ‘の’가 더욱 다양한 쓰임새로 훨씬 빈번하게 쓰이는 반면, 한국어에서 ‘의’는 그만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런 점은 어디까지나 두 언어의 고유한 특성일 뿐이어서 우열을 따지는 기준은 결코 되지 못한다.
위의 다섯 예문에서 보듯이, 조사를 둘 이상 이어 붙여서 표현하는 어법은 일본어의 조사 쓰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그다지 친근하거나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조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서술어 중심인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사 중심인 외국어에 한국어를 끼워 맞춘 결과로 보인다. 즉 근대 이후 외국어, 특히 일본어와 영어를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의’는 쓰임새는 확대일로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모국어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 혹은 모두가 도야, 즉 성장과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감히 말한다면 모국어를 발견하거나 미개척 상태로 남겨진 모국어의 자원을 발견하는 것”(폴 리쾨르, <번역론>)이라고 본다면, ‘의’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원인은 모국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번역의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래 서술어가 중심인 한국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자연스러운 번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명사가 중심인 외국어 표현을 기계적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적절한 서술어를 활용하여 한국어 특성에 맞는 표현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어색한 조사들은 입말에서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라도 글말에서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작가와의 만남’, ‘저자와의 대화’처럼 축약형 표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작가와 함께’, ‘저자와 함께’ 같이 서술어를 생략한 문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