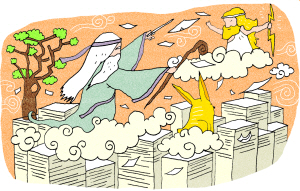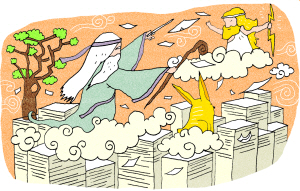
인간적이면서 초월적인 세계
우리 안에는 이야기 본능이 있다(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 실린 글을 읽어주기 바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들려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하는 일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해명할 수 없는 현상에 부닥쳤을 때, 이야기로 꾸미는 과정에서 인간은 그것을 알아 나간다. 고난이나 상처로 얼룩진 상황에 빠졌을 때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구원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한다. 이야기 속에는 풍요로움이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자기 성찰의 정신도 담겨 있다.
이렇듯 이야기를 향한 욕구는 삶의 구석구석에 촉수를 드리우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상상력을 발동하여 개인과 집단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가운데는 인간의 세계를 훌쩍 벗어나 영혼이나 신의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화와 전설을 꼽을 수 있다. 신화와 전설은 인간이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며, 현실을 넘어선 세계로 진입하는 열쇠다.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인간은 인간이면서 신적이고, 삶이면서 죽음이며, 현세적이면서 초월적인 독특한 세계를 창조해왔던 것이다.
신화의 생명은 신성성
말뜻 그대로 풀어보면, 신화는 신의 세계를 다룬 이야기, 전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의 전설을 떠올려보건대, 대개 전설에서는 귀신, 도깨비, 망령(亡靈)이 곧잘 출몰한다. 그것들은 괴상망측하고 엽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비범한 초능력을 지녔다고는 해도, 대체로 죽은 사람이 모습을 바꾼 것이거나 동물이나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다. 이래저래 비교적 인간과 친근한 존재인 까닭에 아무래도 신성성과는 거리가 좀 있다.
이에 비해 신화에 나오는 신은 현세와는 차원이 다른 ‘별세계’에 살고 있다(別世界 혹은 星界). 인간 세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인간사를 두루 관장하는 전지전능의 그들은 인간과 자연을 초월한 신령스러운 존재이기에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다. 애당초 인간과 이 세상을 존재하게끔 해준 창조주가 바로 신이 아니던가.
신화는 삼라만상에서 이 세상 최초로 일어났던 일을 다룬다.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 우주, 자연, 인간, 사물, 제도 등이 신의 손에 의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즉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신화는 신성하다. 신성성은 신화의 생명이다. 만약 신화가 신성성을 상실하거나 부여받지 못하면 신화로서 제 구실을 해내기는 어렵다.
[PAGE BREAK]
신화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
그러나 신화라고 다 신성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 신화가 아무리 널리 퍼져 있고 붐까지 일으킨다고 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읽을거리일 뿐이다. 즉, 한국인에게는 어디까지나 소비하거나 향유하는 서사적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일반교양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될지언정, 그리스 신화가 한국 사회를 통합해주기를 기대하는 한국의 독자는 거의 없다.
원래 신화는 종족이나 민족 단위로 전승이 이루어진다. 민족이나 국가, 지역이나 집단의 흥망에 따라 신화는 신성성을 상실하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한다. 새롭게 나라를 세운 집단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 건국신화를 동원한다.
특히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배층이나 지도자들은 신화에 숨을 불어넣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는 수차례에 걸친 몽고의 침입으로 국토의 피폐와 민중의 수난이 극에 달했을 때 두드러지게 부상했다. 신화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의 단결을 촉진할 수 있었다.
단군이 민족의 시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혈연민족주의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근대적 민족의식의 고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09년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평안도와 백두산 지역의 단군신앙운동을 이어받아 나철이 창시한 대종교(大倧敎)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열강이 침략해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단군신화가 민족의 신화로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화의 진실성 논란?
허구적 이야기라는 뜻의 그리스어 mythos에서 유래한 영어 낱말 myth는 19세기 초엽에 등장했다고 한다. myth는 본디 이야기나 스토리를 가리켰지만, 나중에는 실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어 logos나 historia의 상대어로 통했다.
이후 신화(myth)는 차츰 전설(legend)과 구별되기 시작했다. 전설은 믿을 수 없으면서도 역사와 관계가 있고, 거짓이면서도 어떤 진실성을 품고 있는 이야기인 데 비해, 신화는 거짓이고 믿을 수 없으며 교묘하게 지어낸 속임수라는 뜻이 널리 퍼졌다. 그렇다면 19세기 역사학에서는 신화로 여겨졌지만, 1870년부터 하인리히 슐리만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받은 트로이 전쟁 같은 예는 신화보다는 전설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물의 시원을 이야기하는 신화에서 태초라는 시간은 상상을 넘어설 만큼 아득히 멀 뿐 아니라 전적으로 허구적인 시간이다. 이에 비해 전설은 태초와 현재 사이에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나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로 전한다. 즉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성과 역사성은 전설의 성격을 결정짓는 커다란 조건이다.
그러나 신화의 허구성이 거짓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은 아니다. 신화의 세계는 허구와 상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세속적인 역사 해석이나 과학적 설명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실성을 담고 있다. 신화의 초월성과 비합리성은 인간의 심성이나 정신을 심오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도리어 진실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진실성이야말로 신화를 예술과 문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근원적인 토양으로 대접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설에는 고향이 있다
신화와 전설 모두 인간의 경험적 현실을 넘어선 상상적 내용을 다루지만, 신화에 비해 전설은 역사적 근거나 사실(史實)과 훨씬 더 강하게 결합해 있다. 이를테면 신화 속에 나오는 장소나 유적을 찾아 헤매는 고고학자와 탐험가는 있지만, 신화를 이야기하거나 듣는 사람이 내용의 사실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이에 비해 전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史實)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친숙한 TV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보면 작품 말미에 “☆☆바위에 얽힌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추임새처럼 따라붙는다. ☆☆바위와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와 증거물을 내세워 전설의 내용이 믿을 만한 사실임을 강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설’에는 ‘고향’이 있다.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해체에 따라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 산업사회에서 전설이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창업 신화’, ‘가요계의 전설’에서처럼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하는 말로 쓰일 때, 전설은 겨우 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문화의 스타가 신화의 명맥을 잇고 있다. 20세기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낸 스타의 신성스러움은 신과는 달리 한시적이고 부서지기 쉬우며 세속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과학기술과 인간 이성의 발달로 인해 신화와 전설의 위력은 우리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선 듯 보인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신화와 전설 속에 인간의 심리 저 밑바닥에 침잠해 있는 무의식의 작동과 상징의 뜻을 푸는 열쇠가 들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