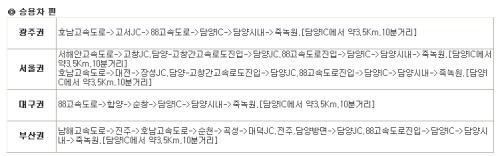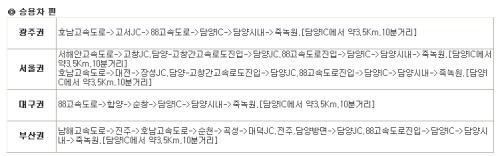8월 4일 토요일 아침. 서산에서 꼬박 네 시간을 달려 전라남도 담양읍 향교리에 도착했다. 아, 이곳은 공기부터가 다르다. 서산이 비릿한 갯냄새가 특징이라면 이곳은 아쿠아향 비슷한 상큼한 풀냄새가 특징인 모양이다.

한여름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이곳의 바람은 서늘하다. 바로 대나무 숲인 죽녹원 때문인가 보다. 저 멀리로 벌써부터 댓잎 서걱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고개를 들어 자세히 바라보니 검푸른 대나무가 치렁치렁 가지들을 늘어뜨린 채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다. 저 곳이 바로 미국 CNN방송에서 그토록 극찬한 한국의 명소 '죽녹원'이다. 나그네의 눈은 금세 호기심으로 반짝인다. 웬만한 인내력이 아니면 저 푸른 녹색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빨리 보고싶다. 관방제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천을 끼고 도는 향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이 죽녹원이다. 나와 아내는 자동차 뒷자리에서 제일먼저 카메라부터 챙긴 다음, 발걸음을 서둔다.
해미인터체인지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하행선을 타고 꼬박 네 시간 동안 운전만 하느라 딱딱하게 굳어 있던 팔다리가 이제서야 뻐근하게 저려온다. 우리 부부는 홍살문을 관통하는 울퉁불퉁한 돌계단을 하나씩 밟고 오르며 굳어 있던 몸을 풀어본다. 하나, 둘, 셋 돌계단의 숫자를 헤아리며 걷다보니 어느새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식힌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대숲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바람을 만끽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천히 대숲을 바라본다. 정말 웅장하다! 녹색의 대향연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대나무 숲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웅장하고 넓은 대나무 숲은 처음이다. 8만평에 빈틈없이 들어찬 수십만 그루의 왕대나무에서 내뿜는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방문객의 정서를 단번에 사로잡는다. 특히 대나무는 소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네 배나 높으며 다른 식물보다 아토피와 스트레스 치료효과도 탁월하다고 한다.
아, 죽녹원이 이토록 실용적이었단 말인가. 감상에 사로잡혀 잠시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천천히 옮긴다. 왕대나무 밭에서는 댓잎 서걱이는 소리가 마치 바다울음소리처럼 신비롭게 들린다. 태곳적 추억을 상기시키듯, 업장(業障) 소멸을 발원하는 듯, 길게 때론 가늘게 이어지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죽녹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산책길이 참으로 정갈하게 잘 꾸며져 있다. 대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숲 주변에 마른 대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쳐놨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그 줄을 뚫고 들어가 대나무에 기어이 낙서를 해놓았다. 그것도 날카로운 칼로 살아있는 대나무를 후벼 파 놓은 것이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제 감흥을 주체하지 못했으면 낙서를 했을까 나름대로 그 심정이 이해가 될 듯도 하다. 바닥에 깔린 마른 댓잎의 촉감도 즐길만 하다. 좀더 위쪽으로 물러서서 관조하자니 대숲이 하나의 성벽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다. 주변의 하천은 천혜의 해자(垓字)요 출입구만 닫아걸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셈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대숲을 걷자니 문득 문태준 님의 '강대나무를 노래함'이란 시가 생각난다.
마음에 벼린 절벽을 세워두듯 강대나무를 생각하면 가난한 생활이 비로소 견디어 진다.
던져두었다 다시 집어 읽는 시집처럼 슬픔이 때때로 찾아왔으므로
우편함에서 매일 이별을 알리는 당신의 눈썹 같은 엽서를 꺼내 읽었으므로
마른 갯벌의 소금밭을 걷듯 하루하루를 건너 사라졌으므로
건둥건둥 귀도 입도 마음도 잃어 서서히 말라죽어 갔으므로
나는 초혼처럼 강대나무를 소리내어 떠올려 내 누추한 생활의 무릎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나를 부르듯 저 깊은 산 속 강내나무를 서럽게 불러 내 곁에 세워두는 것이다.
시인은 대나무처럼 올곧은 삶을 살기를 소원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가난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마음에 벼린 절벽을 세워두듯 강대나무를 생각하면 가난한 생활이 비로소 견디어 진다'는 시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제1길인 '운수대통길'을 한참 걷다보니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란 간판이 보인다. 1972년 베트남 전쟁 당시의 실화인 로미오 포인트의 미스터리를 섬뜩하게 그려낸 영화 알포인트가 이곳에서 촬영되었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베트콩들이 저 컴컴한 대숲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총을 들이대며 "꼼짝 마!"를 외칠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 든다.
제3길인 '샛길'을 지나 제5길인 '사랑이 변치 않는 길'에 들어섰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꼬옥 잡고 걸으면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 마치 서울 남산의 자물쇠 길과 같은 원리인 것 같다. 변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해 본다.
이어서 제6길인 '성인산 오름길'과 제7길인 '철학자의 길'을 통과하여 마지막 코스인 제8길인 '선비의 길'을 빠져나오자 시간은 벌써 쏜살같이 흘러 12시가 넘었다. 마침 대숲 사이로 식당 하나가 보인다. 지친 다리도 쉴 겸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메뉴에는 듣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열무국수와 잔치국수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한 그릇에 3500원. 유명한 관광지치고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다.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식당 안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이 정겹다. 10여분 후 드디어 주문한 국수가 나왔다. 먹음직스런 열무가 듬뿍 얻어진 국수를 한 젓갈 떠서 입이 미어터지도록 먹었다. 우적우적 열무 씹히는 소리와 시원한 육즙이 일품이다. 천천히 먹으라는 아내의 타박을 들으며 나는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며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워버렸다.
마지막 여정지로 죽녹원 내에 있는 기념품가게에 들렀다. 가게 안에는 각종 죽세공품들로 가득했다. 담양은 예로부터 300년 이상을 대나무로 명성을 떨치던 고장이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란 생각이 들었다. 용수, 바구니, 반짇고리, 옷상자, 죽석, 부채, 죽부인, 숟가락, 주걱 등등 없는 것이 없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뭐든지 대나무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가게 주인은 이곳에 있는 제품들은 모두 황토에서 자란 대나무로 만들어 비단처럼 곱고 부드럽다고 자랑했다. 아내는 전을 부칠 때 쓰면 좋겠다며 채반하나를 사들고 가게를 나왔다.
가게를 나오니 하늘은 벌써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저녁 어스름을 재촉하고 있었다. 빨리 숙소를 찾아야 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해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담양나드리펜션에 숙소를 정했다. 죽녹원과 아주 가까운 곳이다. 숙박료는 마침 토요일이라 14만원이란다. 좀 비싸긴 했지만 담양의 주요관광지가 바로 지척에 있어 관광을 하기에는 최적이란 주인아주머니의 너스레에 하루를 묵기로 하고 흔쾌히 숙박료를 지불했다. 객실 안은 매우 청결하여 여행객이 머물기엔 안성맞춤이다. 마치 호텔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서둘러 샤워를 한 뒤 간편복으로 갈아입고 저물어 가는 담양 땅을 내려다본다. 바람이 몰려올 때마다 상큼한 풀냄새가 난다. 녹색의 숲은 어느새 짙은 먹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한다.
문득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든다. 배고픔은 슬픔이고 슬픔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슬픔이 심해지기 전에 어서어서 저녁을 먹어야한다. 담양은 아무래도 대나무가 특산품이니 대통밥을 맛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마음씨 좋게 생긴 펜션 사장님께 물으니 간드러진 전라도 사투리로 죽림원의 대통밥을 소개해 준다.
저물어 가는 담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대통밥을 먹는다. 생죽을 바로 잘라 요리한 밥이라 대나무 본연의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 밥을 떠먹을 때마다 대나무의 진한 향이 몸에, 가슴에, 추억에 스며드는 느낌이다. 그래 이 기분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 가는 대로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대로 살아가고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저대로 맡기며 살리라. 나는 또 다른 대나무 시 한 편을 읊조리며 담양에서의 첫날밤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