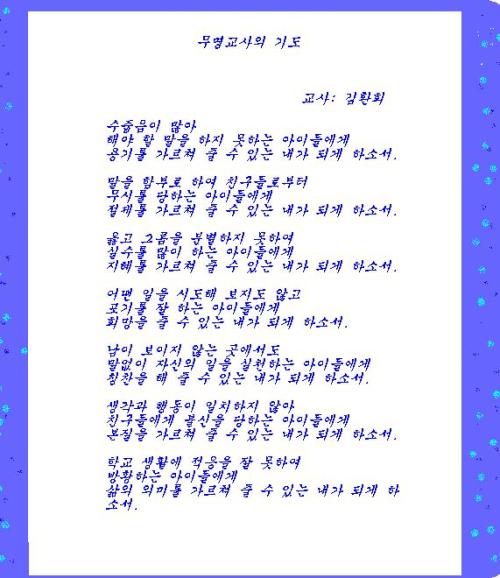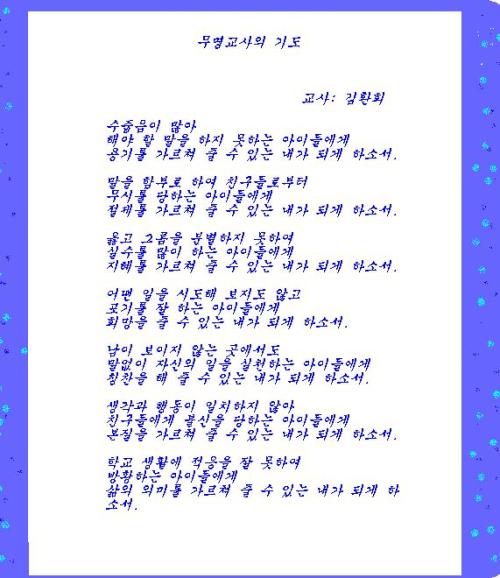
7월 12일(화요일).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학급의 시간표 위에는 내 과목인 영어가 없는 날이 오늘이다. 방학(7월 15일)을 며칠 앞두고 오늘 중으로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일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수업과 업무로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만 했다.
그래서 일까? 아침에 실장으로부터 우리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고 난 뒤 우리 반에 대해 오후 내내 잊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워낙 바쁜 나머지 출근을 하자마자 습관처럼 되어버린 교실 출석확인도 오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오후 7교시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인기척을 해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중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가 책상 위에 커피 한잔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리 반 여학생 두 명이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평소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이 녀석들이 왔으면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선생님이 지금 바쁘니 급한 일이 아니면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도록 해라."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그치듯 요구를 하는 내 표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실망스러운 듯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
"선생님이 보고 싶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선생님, 오늘 교실에 한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나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바빠서 그랬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아침이면 늘 교실로 찾아와 출석을 점검하며 청소상태, 복장 및 용모 등으로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던 담임이 오늘은 나타나지 않자 아이들 나름대로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더욱이 오늘은 우리 반 수업이 없어 아이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담임으로부터 매일 듣는 잔소리를 하루 정도 안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거울 텐데. 내가 보고 싶다며 교무실로 찾아 온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이들은 선생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내가 보고 싶어 왔다."라는 그 아이의 말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듯 했다. 생활을 하는 와중에 내 속을 썩이던 아이들이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 또한 잔소리를 늘어놓는 담임인 내가 가끔 보고 싶어질 때가 있는가 보다. 내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말이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아이들과의 짧은 이별을 나누어야 할 여름방학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름지기 아이들은 많이 변하리라 본다. 따라서 개학이 되면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성숙해서 내 앞에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아이들은 늘 한결같이 마음 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 모두가 탈선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여름방학을 나게 되기를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