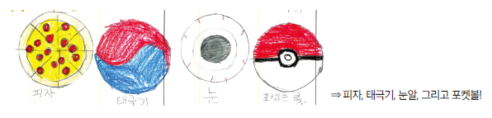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수학을 꿈꾸다’ 시리즈는 1월호 ‘철학(哲學)을 활용한 수업사례’를 끝으로 마무리 짓는다. 인문학을 수학과 결합해 수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직은 초등학교에서 인문학이라는 소재가 낯설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수학 외적인 정보나 단순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많았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인문학이 수학과 결합한 형태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교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문학·역사·철학이라는 각각의 영역을 ‘수학’과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기 초보다 분명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복식학급의 8명 학생 모두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기대 이상의 일이었다. 수학과 문제해결역량이 높아지고, 수학적 대화와 의사소통을 즐기게 됐으며, 수학시간을 기다리는 학급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식학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미처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이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진행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던 몇몇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다. 연산 영역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접근이 부족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양주동 박사의 수필 몇 어찌를 보고 이해한 적이 있었다. 수학책에 나오는 ‘기하’라는 말이 음차 된 것을 모르고, 한자의 의미 그대로 몇 기(畿), 얼마 하(何)로 해석하고는 도대체 ‘몇 어찌’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 했던 일화를 담은 수필이다. 양 박사는 그날 기하수업에서 배웠던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는 원리를 선생님과의 대화체로 풀어내고 있었다. 문학으로 수학을 깨달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복식학급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담임교사로 지내면서 주베르(J. Joubert)가 남겼던 ‘가르치는 것은 두 번 배우는 것’이라는 말은 큰 도움이 됐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함께 자랄 수 있다는 신뢰는 인문학에서 출발하여 TAI 협력학습 기반 ‘THINK 모형’으로까지 이어졌다. 미래의 교실이 무학년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학년의 구분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기제였기에 두 개의 학년으로 하나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학년 여덟 명 학생들은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수학수업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복식학급, 학교통폐합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본교는 전교생이 20여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이다. 그러다보니 2개 학년을 함께 놓고 가르치는 복식수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년주의 도입 이후, 같은 연령의 학생이 하나의 학년,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학생부족·교실부족 또는 교사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학급인 ‘복식학급’이 운영되기도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전국적으로 복식학급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은 2개 학년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 한다. 마치 ‘필요악’처럼 되어버린 복식학급은 ‘학교통폐합’만이 최선의 대응책일까?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식학급 및 복식수업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복식학급을 피할 수 없다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복식학급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미래 수업의 가능성을 여는 수업방법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 융평 수학의 길을 열다 첫 수학수업 시간, 서로 다른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 앉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