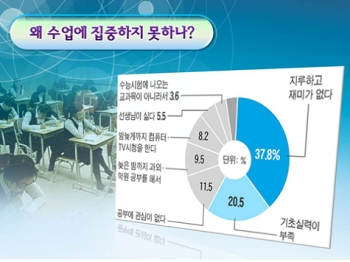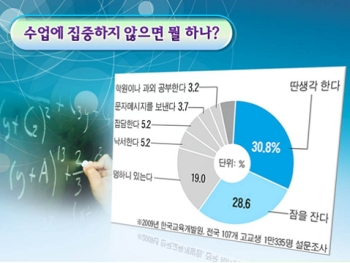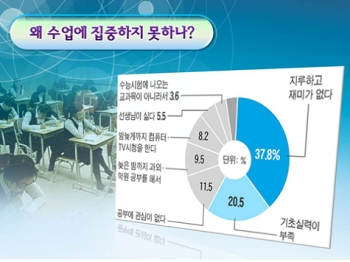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통 유교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존경심의 절대적 존재였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에는 마을마다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당이 있었다. 서당의 교육적 기능은 대단했고, 당시 사회의 문화적 가치 전승과 입신출세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근대 대중교육 제도의 강제 도입으로 인해 서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육과 야학 등의 형태로 유지되던 것마저도 일제 식민지 시대 후반기에는 거의 사라졌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교에는 과거의 유교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의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형태에도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전통이 내재하게 되었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군사문화가 학교의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기형적인 문화는 ‘경제 건설에의 기여’라는 국가와 사회의 계획적인 발전 원동력을 제공했으나, 이 와중에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한다는 교육본질은 도외시됐다. 교육을 사회발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고,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변화는 고스란히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풍토는 학교의 주인은 나라이고, 학교이며, 관리자와 교사라는 인식을 갖게 해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체벌이 행해지고 있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적발 건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름 대신에 ‘야’, ‘학생’, ‘너’ 또는 더 심한 반말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쓰이고 있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존중감을 갖도록 뭔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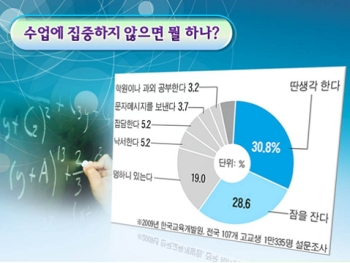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 또한 학생임을 모르는 학교나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학교나 교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세기 초반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너무 낮은 취학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는 축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브라질의 실정을 감안해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축구로 편성하고, 나머지 40%를 교과로 편성해 운영했는데, 그 결과 취학률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학교에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싶어 하고 학교에 가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우리 학교 전교생이 빠짐없이 등교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체육대회 날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어이없어서 웃고 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