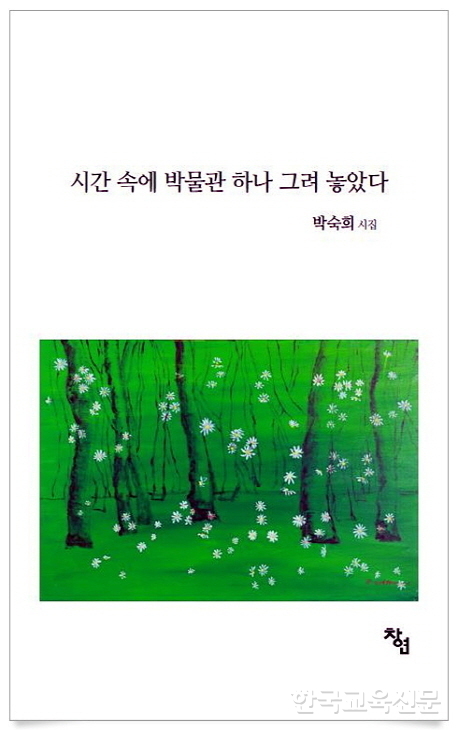 노오란 은행잎이 바람에 우수수 날리는 날이었다. 서원곡 계곡 앞에 쌓은 수북한 은행나무잎을 지나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민속산장에서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관음보살의 눈매를 닮아 선하게 보이는 분이 수줍게 내민 한 권의 시집, 그래서 그녀의 글에서는 노랑으로 색칠한 은행나무가 계속 생각나나보다.
노오란 은행잎이 바람에 우수수 날리는 날이었다. 서원곡 계곡 앞에 쌓은 수북한 은행나무잎을 지나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민속산장에서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관음보살의 눈매를 닮아 선하게 보이는 분이 수줍게 내민 한 권의 시집, 그래서 그녀의 글에서는 노랑으로 색칠한 은행나무가 계속 생각나나보다.
후설(Husserl, Edmund)은 “지각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 그 양자의 관계”라고 하였다. 공간이란 화강암, 대리석 등 수많은 상징을 매개로 우리는 공간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소통하고 인식하여 왔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화한 기억이다. 시인 박숙희는 시집 『시간 속에 박물관 하나 그려 놓았다』에서 공간 속에 드러나는 기억을 소환하여 그것을 시 속에서 펼치고 응시하고 보듬었다가 다시 자신의 향기를 묻혀서 돌려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시 속 공간들에서는 그녀의 향기가 묻어난다. 박물관에서는 싸아한 박하향이, 표충사 계곡에서는 시원한 허브향으로 되살아 난다.
박물관 불빛에 잠자는 그림자들 바람을 손에 쥔채
동수원 사거리의 해탈을 업고 홀연히 돌아간다
어디,
겹겹이 매물도를 껴입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의 길 속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베갯모에 두었던 사랑 가지고 왔는지
손톱빛 달무리는 또 얼마나 창백해 질 것인지
진회색 문풍지 호리는 바람자리 접고
달빛 무릎 이슬에 적실 때 처녀성 사랑일까
초승달,
흑백사진 속에도
어느덧 매화향 꽃이 핀다. / <시간 속에 박물관 하나 그려 놓았다 >전문
동수원 사거리 박물관 불빛 속에서 그녀는 매물도의 기억을 소환한다. 베갯모 속에 숨겨두었던 어설프고 안타까운 첫사랑이 흑백으로 물든 사진 속에서도 매화향 꽃이 피었다. 겨울 속에 첫 향기를 풍기는 매화처럼 초승달을 휘감는 달무리의 아련한 추억이 첫새벽이면 슬프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시인의 사랑은 향기롭고 아름답고 슬프다. “잠시 머물다 갈 사랑이라서/ 먼 뿌리에서 온 그대가 아닐거야/너무 깊고 먼뿌리에서 온 그대가 아닐거야” 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랑을 찾아보지만, 허무가 일상이 되어서 떠도는 사람에게 그대는 너무 먼 곳에서 휘돌아 흐르는 바람이고, 깊은 뿌리이고 나에게 닿는 시간은 짧기만 하고 이별은 길다.
계곡의 물소리가 만드는 어둠이 저녁 바람의 흔적이다.
내 청춘을 자랑했던
푸른 눈을 가진 숲은
해그림자를 안고 저녁을 사랑하려 한다.
물소리가 내 곁에 와 있는 시간
멀리서 온 편지의 그늘이 내 곁에 와 있는 시간
개울가의 물 흐르는 소리
찬불가 소리에 탑이 꿈꾸는 소리
나를 씻겨내는 소리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는 소리
물에 씻기는 기억
<중략>
가벼운 울음에도
어둠이 내리는 표충사 계곡
울음으로 물소리 흉내를 내어보면
어느새 아이의 발바닥에 비치는 빛으로 태어난다
빛은 흐르는 물살 위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여행 수첩> 부분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공간의 시학』에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 (중략) 우리들이 오랜 머무름에 의해 구체화된 지속의 아름다운 화석들을 발견하는 것은, 공간에 의해서, 공간 가운데서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계곡의 물소리가 만드는 어둠이 저녁 바람의 흔적” 시간의 지층, 켜켜이 쌓여 표충사 계곡은 산란하는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기억의 공간은 빛과 어둠, 참회와 설움이 중첩되어 의식과 무의식이 관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봄, 여름의 푸른 눈
늦가을의 갈색눈
겨울의 앙상함을 눈부시게 하는
눈동자의 빛을 닮은 파란 세월의 눈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는 메타세콰이아나무가 되어 간다
비바람을 불렀다
태풍에 마음 다칠 줄 몰랐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불쑥 온 몸을 드러내었다
아 아파요 말하기도 전에
부러져 뒹군다
나를 바라본다
슬며시 눈을 돌린다
그래 그 곳은 너의 쉼터가 아니었어 <가을 수첩> 부분
푸른 메타세콰이어나무의 찬란함은 젊음 그 자체이다. 그러나 푸른 눈의 서늘하고 밝은 기억이 가을로 오는 길목에서 갈색의 처연한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순일한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막스 피카르트에 의하면 가을이란 ‘마치 침묵이 새로 한번 숨을 쉬고 난 뒤인 듯 가을이 온다’라고 하여 시간에 침묵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시인이 그린 가을 수첩에도 시간과 시간 사이에 느껴지는 침묵의 언어가 숨어 있다. 나무가 침묵을 시작하는 가을을 수첩 속에 옮겨 적으며 시간이 그려내는 모든 나무의 기억이 공간화되어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녀의 시속에서 수많은 공간들이 물고기 비늘이 되어 기억으로 소환되고, 바람이 되어 계속을 날아, 나무의 향기로 거리를 떠돈다. 기억의 공간 속에 민들레 홀씨처럼 떠도는 씨앗은 바람을 타고 한 줌의 흙을 만나 시가 되고, 언어가 되어 시집 속에 오롯이 내려앉아 피어난다. 특히, 시인의 시는 읽을 때 더 따뜻하고 향기롭게 다가선다. 시는 본래 음악이었다. 시의 본령인 음악이 될 수 있는 시는 읽기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은행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날리듯 기분 좋은 시집이다. 가을이 저만치 가고 있다.
『시간 속에 박물관 하나 그려 놓았다』, 박숙희 지음, 창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