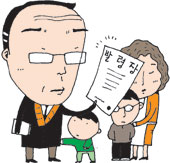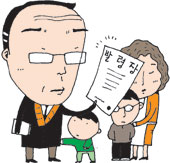
새벽 4시라 식구들 몰래 일어나니 가족들이 한방에 모여 앉아 나만 쳐다본다.
“발령이 나서 3년 후에 우리 가족 한자리에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고1짜리 큰놈은 낙천주의자라 부모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 둘째는 고집이 황소라 잘 다독거려야 하고 막내는 엄살이 심하고 말썽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가 없으면 아내 혼자서 눈물 흘릴 때가 한두번이 아닐 텐데….
13년전 으슥한 새벽 4시, 나는 발령장을 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교육청에 발령장을 드렸더니 “선생님, 축하합니다. 남부에서 꿈을 펼치세요” 한다.
그 곳은 내가 18년전 총각시절 근무했던 곳이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추억과 범벅이 되어 한편 반갑고 한편으론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추억의 교문을 들어서니 어떤 여선생님이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글쎄요.”
“16회 제자 은자에요. 많이 늙으셨군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명문 학교라 근무하시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줍니다.”
그날 밤 선생님을 초대한다기에 흰머리 검게 하고 식당에 가보니 열일곱 명의 제자 아줌마가 반갑다고 야단이다.
“선생님,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승진하셨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은 세월을 모르잖아. 너무 무서워서 아부를 못하잖아.”
부임 4일째 가족의 편지가 왔다.
“당신이 떠나신 후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아빠를 그려놓고 학교 오갈 때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군요. 꼬마 녀석이 아빠 언제 올지 묻기에 네가 1등 하면 온다고 했지요.”
3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 큰놈은 대학에 가고 중간 고집쟁이는 고등학교에, 엄살쟁이 막내는 중학교에 갔다.
오늘도 그놈의 발령장을 보면 나는 가족 모두에게 미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