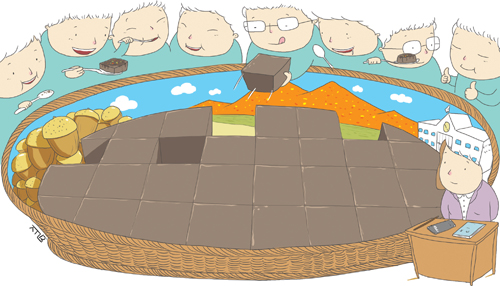또 10월을 맞는다. 예년처럼 교정에서는 철따라 목련이 순백의 십자가를 환하게 걸었다가 졌고, 학교 정문 근처 살구나무는 살구꽃 편지를 곱게 띄우고는 흩어졌다. 학교 후문의 해당화는 시절 인연이 다 했는지 연붉은 화장을 지웠고, 찬바람이 불자 급식소 앞 능소화는 나팔을 팡팡 불다가 뭉텅뭉텅 졌다. 시간의 강물은 야속하고 애달프지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다. 노란 은행잎을 한 장 한 장 줍는 마음으로 그 해 10월을 조용히 펼쳐본다. 그 때 그 아이들은 교정에 없지만 그네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본다.
10월 가을 소풍이 우리 반 가까이 와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속에서 가을 소풍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의 기도’ 사이에서 가을 소풍이 다가왔다. 소읍 시골의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7반 담임을 맡아서 나는 몸과 마음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한 생각 깨우치고자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딴에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기 위해 학반 체육대회도 열고, 교실에서 비빔밥도 함께 해 먹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의 눈을 피해 교실에서 어묵을 삶아먹는 사이 10월 가을 소풍이 가까이 와 있었다. 교정의 느티나무가 아이들의 먼지를 기꺼이 받으며 곱게 물들어 가고 있는 사이 가을 소풍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인근 반에서는 소풍 목적지를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직지사, 아니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경상북도 포항 바닷가로 정한 후에 촌놈들의 분위기는 달떠 있었다. 아니면 마음껏 한판 놀아보자는 심사로 대구시 우방랜드를 소풍지로 정한 반도 있었다. 이들 반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야하고, 한 폼을 잡기 위해서는 옷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나는 담임의 의도를 숨긴 채 반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있었다. 반 아이들에게 동정에 호소하며 넌지시 녀석들을 꼬드겼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이 요새 마이 어렵제?”
“예.”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자식 된 도리가 아니제?”
“예.”
“부모님께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효제?”
“예.”
“그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반은 학교 인근에 있는 작오산과 낙동 강변으로 소풍간다. 이의 있는 사람은 교무실로 따라 온나….”
담임의 터무니없는 궤변에 아이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판정패를 당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담임 스스로가 지혜로웠다. 역시 나는 뭔가 색깔이 있고 철학이 있는 교사라면서 자화자찬을 거듭했다. 담임에게 당한 아이들은 뭔가 찜찜했지만 항변을 하지 못한 채 우리들만의 멋진 가을 소풍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되었다. 학반 부서의 부장들과 회장단은 소풍 며칠 전부터 풍성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그날 일정표를 짜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소풍날이 되었다. 반 아이들과 학교 인근에 있는 흥국사에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다. 그 날 아침까지도 녀석들은 맨밥 도시락을 손에 들고 기분이 쳐져 있었다. 다른 반 친구들은 버스 타고 바닷가로 놀러 가는데, 우리 반은 바로 옆에 있는 산과 강변 모래밭으로 소풍을 간다며 입이 열두 발로 나와 있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먼저 모둠별 도토리 줍기 대회를 시작했다. 녀석들은 여전히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를 인간이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된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도토리를 가장 많이 주운 팀에게는 많은 상품이 돌아가기에 반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토리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 꼬챙이로 낙엽사이를 후벼 파거나, 나무를 흔들거나 하는 소리로 온 산이 시끌벅적 했다. 굴참나무 잎들이 반 아이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 시간 남짓 도토리를 주운 뒤, 흥국사에 들러 예불을 드렸다. 세월이 흐르면 눈 맑은 저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겠지만 자신의 신념을 갖고 한 세상 잘 헤쳐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 세상 살다보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는가. 유한성과 찰나를 살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일상 속에서 행복과 지혜를 찾게 해 달라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수기안인(修己安人),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살아가기를 소원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낙동강변 모래밭으로 장소를 옮겼다. 모래밭은 10월의 가을 햇살을 받으며 금모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모래밭은 받아쓰기 노트처럼 깨끗하게 펼쳐져 있었다. 소풍 전 날 반장이랑 강변 모래에 숨겨 둔 보물찾기를 하며 녀석들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새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모래밭을 휘저으며 마음껏 학교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어서 분임별로 준비해온 도시락과 과일을 먹으며 대자유를 누렸다.
점심을 먹은 후 분임별로 모래성 쌓기, 뒤로 달리기, 옷 연결하기, 기마전, 신발 멀리 던지기, 깡통 차기 등의 경기를 하면서 마음껏 웃었다. 우리는 낙동강변 모래밭에서 함께 뒹굴면서 학반 급훈인 ‘자타불이(自他不二)’처럼 너와 내가 한 몸, 한 뜻이 된 듯했다.
도토리 줍기와 경기 점수를 종합해서 조별로 시상을 하고 반기를 휘날리며 반가를 한 번 부른 뒤 우리는 각자 귀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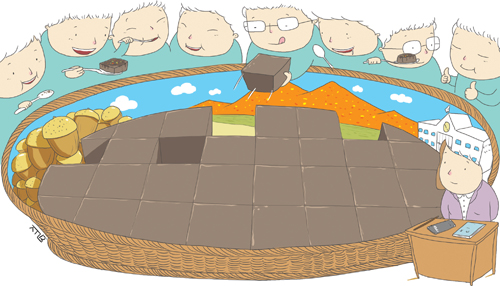
녀석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도토리를 주웠는지 한 마대가 꽉 찼다. 도토리를 차에 싣고 인근 시골 고향 방앗간에서 도토리를 빻았다. 묵을 만들려니 양이 너무 많아서 막막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노동인가 생각하면서 시골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밤이 늦도록 도토리 가루를 거르고, 불을 지폈다. 늦은 밤까지 부산한 풍경이 무슨 잔치를 앞둔 집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슨 마술을 건 것처럼 도토리는 두 광주리의 묵으로 변해 있었다. 두 광주리의 묵을 차에 조심해서 싣고 학교에 도착했다. 시골의 노모가 만들어 준 간장과 함께 묵 한 광주리는 교무실 선생님들께서 드시도록 하고, 한 광주리는 반 학생들이 먹게 교실에 갖다 놓았다. 토요일 1교시 담임 시간인 국어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이 묵이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교과 수업 대신 묵 수업이다”라고 말했다. 녀석들은 환호하면서 분임별로 둘러앉아서 묵을 자르고, 쟁반에 담은 후 손이 바쁘게 묵을 먹고 있었다. 녀석들은 어제의 가을 소풍을 묵과 함께 추억하며, 행복한 듯 했다.
나는 가능하면 말을 아꼈다. 그저 즐겁게 이야기하며 묵을 먹는 녀석들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번 소풍을 계획한 담임의 의도를 알아주어도 그만, 몰라주어도 그만이었다.
가을 작오산과 낙동강변에서 자연이 인간의 스승임을 가르치고 싶었다.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배우고자 했는데 그 깊은 뜻을 녀석들은 알았는지 모르겠다. 산짐승이 먹어야 할 도토리를 우리가 주운 것은 상당히 미안한 일이지만,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즉,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녀석들이 알았는지 모르겠다. 묵을 먹는 행위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공부의 수단임을, 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함을 녀석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다. 순수한 추억이 너희들의 영원한 재산임을, 사회생활이 힘겨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이 친구들임을….
또 10월이 지나가고 있다. 교정의 느티나무에서 한 여름을 울었던 매미는 어디로 떠났을까. 어느새 느티나무 한 잎 한 잎 날리고 있다. 시간의 강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도 똑같은 강물을 두 번 건널 수는 없다. 하지만 꽃잎처럼 아름다웠던 지난 날, 꽃나무 잎이 꽃의 배경이 되어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준 그 시절은 오래 오래 남는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인생처럼 조금은 쓴 묵 맛이 아직 나의 입 속에 맴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