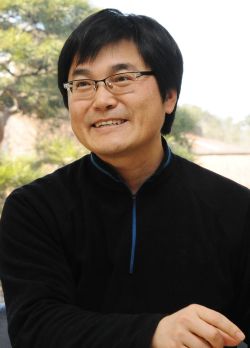청소년 행복결정 요인…건강, 부모와의 대화
“근로 시간 단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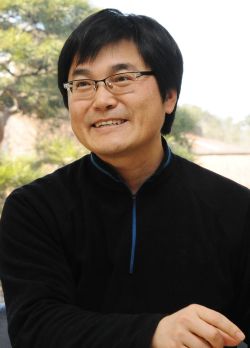
청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학력이나 경제수준 등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자아성숙 같은 정신적 요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용(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20대의 대부분은 중․고교 시절 예체능에 흥미가 있고 자아성숙도가 높으며 가정생활에 만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2004년 중․고교생이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아성숙도,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조사한 후 이들이 2011년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행복수준을 측정,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 분석해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을 찾고자 했다.
반면 가정의 자산 정도, 학업성취도, 사교육비용 등은 7년 후의 행복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꼭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며 “가정생활 만족은 행복한 청소년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났듯 이들이 가정에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4년 연속 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를 행복 결정요인을 통해 진단하면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도 ‘행복교육’을 주 어젠더로 설정한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요즘 강조되는 밥상머리 교육이나 학생오케스트라 등 소통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방향 설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부모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