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1996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대사이다. 지금 자기가 사는 동네를 여행해 보는 거야.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골목들 길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애정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건축학개론의 시작입니다. "'정릉'이 누구의 '릉'이냐"라는 교수의 질문에 여 주인공이 "정조? 정종? 정약용?"이라고 대답하자 다른 학생들은 웃는다. 하지만 정릉이 실제 누구의 릉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릉(貞陵)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의 능이다. 신덕왕후를 총애했던 이성계가 경복궁 인근인 정동(貞洞)에 두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140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사적 제208호로 지정되어 있다. 태종이방원은 이성계를 꼬드겨 이복동생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게 한 계모 신덕왕후를 싫어하였으며, 신덕왕후 역시 방원을 경계하였다. 신덕왕후가 사망한 후, 결국 이방원은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정도전을 잡아두고 이복동생이방번과이방석을 붙잡아 죽였다. 이후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덕왕후를 비롯한 외척에 대한 경계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정동에

경기도 연천군은 화산지대였다. 그래서 현무암을 어느 곳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돌을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 신기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주도 이외에 이렇게 흔하게 현무암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또 있을까? 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탄강과 임진강 주변으로는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또 자연스럽게 권력자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인 고인돌(지석묘)이 연천군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용암, 화산지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바위의 형상은 장관을 이룬다. 임진강과 한탄강을 타고 흐르던 용암은 굳어서 거대한 절벽을 형성했다.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이다. ○ 좌상바위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307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에서 이적요 시인이 했던 말이다. 그는 시인 로스께의 말을 인용하며 “늙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입어 본 적이 없는 납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늙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은 ‘상실의 벌’ 일지도 모른다. ‘벌’은 슬픈

경기도 연천에는 망국의 한이 서려있는 장소가 있다. 경순왕릉과 기황후릉 터다. 경순왕이 통일신라의 마지막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의 릉이 경주가 아닌 이곳 연천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소하다. 경순왕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듯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가 또한 어느 순간 그 역사를 다하게 된다. 삼국시대의 마지막 패자였던 통일신라 역시 예외는 될 수 없다. 천년의 영광을 누렸던 통일신라는 경순왕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짧은 오르막길을 지나면 외롭게 자리한 경순왕릉을 만난다. 오르막길 주변에는 철책선이 2m이상 높이로 쳐져 있으며 지뢰가 있다는 표식이 보인다. 경순왕릉 주변의 숲은 군사지역이라 출입이 통제되며 바로 앞이 민통선이다. 삼엄한 경계가 느껴질 정도였다. 경순왕은 통일신라의 56대 임금이다. 신라의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경주시 밖에 위치해 있다. 왕릉이라 하기에는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도 사연이 있다. 현재의 왕릉은 1747년에 경순왕의 후손들이 왕릉 주변에서 묘지석을 발견하면서 새로 정비한 것이다. 재정비 당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대부 묘의 격식을 따라 꾸몄다. 경

4, 5, 6세기는 삼국의 나라들이 제각기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이다. 삼국의 전성기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최대 영토를 획득한 시대를 말한다. 백제는 375년 근초고왕, 고구려는 476년 장수왕, 신라는 576년 진흥왕 시절이다. 연천 지역의 은대리성, 호로고루성, 당포성은 모두 고구려의 남하정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탄강변에 있었던 성들은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략적 가치의 상실로 인하여 폐성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도 연천군 지역에는 옛 삼국시대 성터가 여러 개 남아 있다. 한강유역과 더불어 이 지역은 옛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이다. 한국전쟁 뿐 아니라 옛 삼국시대에도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많은 피를 흘렸던 곳이다. 한탄강와 임진강을 기점으로 적을 방어하기 용이한 지역에성터가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은대리성, 당포성, 호로고루 성이다. 일시적으로 백제, 신라에 내어 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고구려 소유의 성으로 추정된다. 연천군에 이러한 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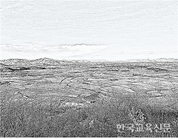
인간은 땅속에 지뢰를 묻어놓고 무서워 벌벌 떨며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은 전혀 두려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뢰밭을 점령해 버렸다. 「소이산」을 두고 누군가가 했던 말이다.소이산(所伊山)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四要里)에 위치하는 해발 362m의 낮은 산이다. 노동당사(勞動黨舍) 바로 앞에 있다. 철원(鐵原)은 우리말로 ‘쇠둘레’라 하며 해방 당시부터 6.25전쟁 때까지 북한 땅이었다. 접경지대의 주민들이 늘 그러하듯이 자신들의 이념에 대하여 동조와 선택을 강요받았고 그 결과물로 수많은 생명이 죄없이 죽어갔다.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지켜낸 슬픔의 땅, 바로 이곳 철원이며 그 중심에 소이산이 60여 년을 무덤덤하게 자리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오랜 금단(禁斷)의 시간을 풀고 우리에게 그 속살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소이산을 방문한 것은 겨울답지 않게 따스했던 1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다. 철원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는 중에 연천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 P를 길잡이 삼아 방문하였다. 친구는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이고 필자의 부친은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다.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시다. 나름 우리는 요즘 말로 국뽕(?)에

연천을 가로지르는 경원선(京元線)은 서울-원산(元山)을 잇는 철도로 길이 223.7㎞이며 1914년 9월 16일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오늘날에는 국토 분단으로 용산역~백마고지역 사이의 94.4㎞만 운행되고 있다. 용산에서 출발하여 서울 북부지역 – 의정부 – 동두천 - 소요산을 지나 연천군의 첫 역인 초성리역에 진입한다. 이후 한탄강, 전곡, 연천, 신망리, 대광리, 신탄리, 백마고지역까지가 경원선의 연천 구간이다. 경원선이 지나가는 간이역을 따라 연천 여행을 해보았다. 연천군의 주요 지역들을 지나는 역들이다. 전곡역, 연천역은 2023년 신축된 현대식 역사가 오래되고 낡은 간이역 건물을 대신하고 있다. 전곡읍까지만 주로 갔었던 터라 이전에는 소요산역에서 전철을 내려 버스로 갈아탔다. 소요산역에서 전곡이나 연천까지 가는 기차는 그 간격이 너무 길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승객이 거의 없다. 덜컹거리는 열차를 타고 산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시간이 기억난다. 8월의 어느 날,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던 40년 지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간 이후 1년에 한 번을 보기도 빠듯하다. 모처럼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