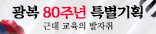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은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종래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은 받기 힘들게 했다.
이는 기초 교육만을 시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꾼이나 생산시설 등에서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일본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칙(1911. 9. 15)을 공포했다.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민족주의자들은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마저도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무산시키려 했다.
3.1운동 이후 탄압 심해져
3.1운동은 일본의 교육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반일감정이 커지자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교육 연한을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3면(面) 1교(校)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수를 늘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도 실시했다. 또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대학설립규정을 제정했으나,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세우려고 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한국인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은 계속 억제했다.
일본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는 일본어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한국사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깎아내려서 일본 지배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론을 가르쳤다. 즉 붕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치부하며 한국인은 분열주의자이고, 한국인은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타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적인 근대화가 어려운 한국을 일본이 보호해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대화를 위해 합방했다는 것이다.
민족 말살 도구로 쓰여
일제의 황국신민을 위한 정책은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한국과 일본은 한 몸’이라며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의 강요(1937. 6), 창씨개명(1940. 2),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수 및 사용 금지(1943. 11) 등을 통해 일본의 국가 의식과 일왕 숭배를 강요했다. 한국사 및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 한민족의 의식, 언어, 역사 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특히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짓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취학도 금지했다.
일제는 1941년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교육마저도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전시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교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로, 교육체제는 전시체제로 바꾸면서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어·한국사·한국지리 교육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 ‘보통학교 국사’를 ‘초등 국사’로 개편하면서 한국사 교육을 아예 삭제해 우리 역사를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학도근로령으로 학생들을 군수산업에 동원하고, 지원병제 및 징병제를 실시해 전쟁에 투입했다. 일제의 정책으로 한국인은 철저히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꺾이지 않는 민족정신
그러나 일제의 교육은 한국인들 사이에 강인한 민족정신을 키워줘 항일정신으로 발전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비밀 모임과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전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학습한 한국인들은 정체성을 지켜내며 항일독립투쟁을 지속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