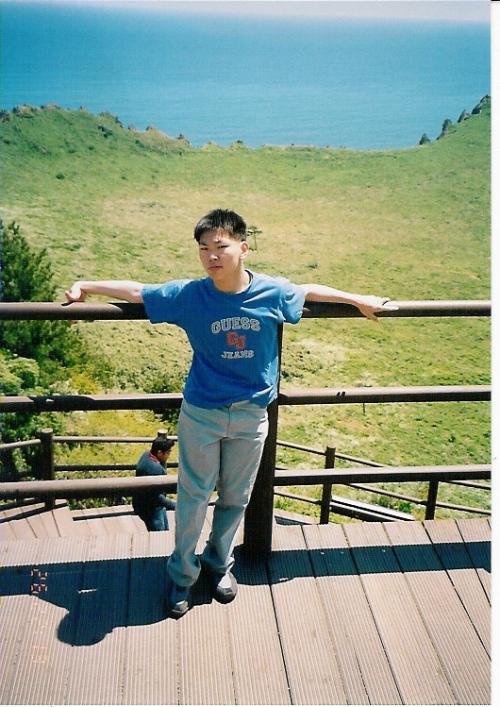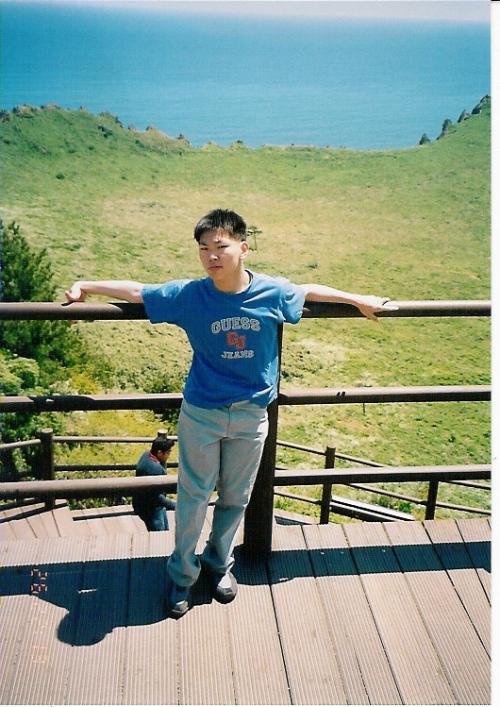
퇴근 시간, 교무실 문을 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1학년 3반 ‘익진’이라는 아이였다. 뇌성마비로 말도 잘 못하고 걷는데도 불편함이 많은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는 맨 앞에 앉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내 수업을 경청하는 아이였다.
“익진아, 여긴 어쩐 일이냐. 누굴 찾으러 왔니?”
내 말에 그냥 피식 웃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리 쉽게 나오지가 않는 듯 했다.
“선~상님”
“그래, 말해 보거라.”
‘익진’이의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과자봉지 같았다. 두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오자 그 과자 봉지 위에 ‘뭉클’이라는 두 단어가 선명하게 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부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던졌다.
“익진이에게 그 과자 선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겠구나.”
‘익진’이는 불편하고 때묻은 손으로 과자봉지를 내 앞으로 쭉 내밀었다.
“그래 이거 누구에게 전해줄까?”
“선~상님……”
“그래, 부끄러워 하지말고 얼른 말해 보렴. 여 선생님인가 보구나.”
“선~상님……”
갑자기 ‘익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봉지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돌아서서 절뚝거리며 교무실 문 쪽으로 나갔다. 나는 교무실 문 쪽으로 빠져나가는 ‘익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익진아,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자~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지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퇴근을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니 어제 저녁 ‘익진’이가 준 과자 봉지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문득 시장이 반찬이라 과자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과자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과자 봉지가 가벼웠다.
“내용물이 없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익진’이가 장난을……”
과자 봉지를 들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볼펜으로 쓴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무슨 글씨인가 궁금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신인이 ‘김환희 선생님께…’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건 과자봉지가 아니고 편지 봉투였다. 그 봉지 위에는 온갖 광고성의 문구들이 적혀져 있었다.
“뭉클, 우정크림케익, 기분업그레이드, 쵸코과자, 칼슘함유 등…….”
이건 누가 보아도 과자봉지라고 생각하지 편지 봉투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문득 어제 저녁의 일이 떠올려졌다. ‘누구에게 볼 일이 있어 왔니?’라고 물었을 때 ‘익진’이는 말을 더듬으며 두 번이나 ‘선~상님’이라고만 대답을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부탁의 말로 해석을 했을 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금 생각을 해 보니 ‘선~상님’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 순간에는 설마 ‘익진’이가 나에게 편지를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뭉클’이라고 적힌 과자 봉지를 아니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다. 편지를 펼쳐보니 똑 같은 글의 내용이 두 번이나 적혀져 있었다. 한 내용은 오른 손이 불편한 ‘익진’이가 왼손으로 쓴 것이었고, 또 하나는 친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대필하여 쓴 것이었다.
아마도 이것은 ‘익진’이가 나에 대한 배려로 생각되었다. 사실 글씨가 엉망이었고,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익진’이가 교과 담임인 나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다음 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3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갑자기 던져진 나의 질문에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서로 쑥떡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아이들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맨 앞에 앉아 있는 ‘익진’이를 바라보았다. ‘익진’이는 마치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피식 웃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실망을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 이었단다. 같은 반에 그런 친구가 있기에 선생님은 다른 반 아이들은 몰라도 너희 반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단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말이 끝나자 ‘익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떨구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 하물며 지금 너희 반에서도 주인공인 ‘익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익진’이에게 관심을 보여 준 친구가 있었니? 선물은 주지 못할지언정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건네 준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구나.
우리 주위에는 ‘익진’이처럼 육체적인 장애인도 많지만 정신적인 장애인도 많단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전자보다 후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으로 살아가는 요즘 언제 우리도 장애인이 될 지 모른다는 사실이란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선천적인 장애보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처럼 후천적인 장애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단다. 앞으로는 우리 ‘익진’이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이자. 알겠니?”
아이들은 모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힘차게 대답했다.
“예, 선생님!”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마자 아이들 모두는 ‘익진’이에게 다가와 ‘익진’이를 껴안으면서 ‘미안해’라는 말을 연발하였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나는 ‘익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교실 밖으로 빠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