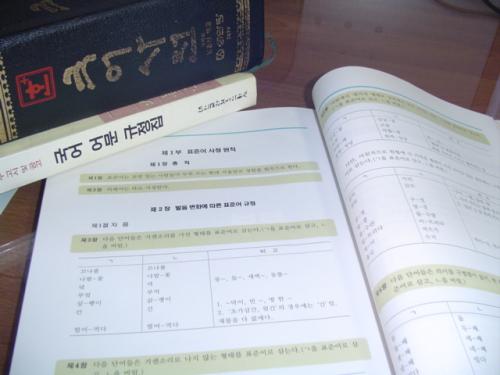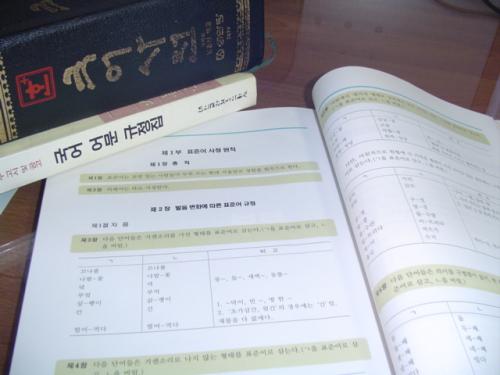
우리 문학을 공부하다보면 ‘접동새’와 ‘소쩍새’를 자주 만난다.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 보면,
○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니/산 접동새와 난 비슷하여이다.(정서의 ‘정과정곡’)
○ 이화(梨花)난 발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제/낙산동반(洛山東畔)으로 의상대(義湘臺)예 올라 안자(정철의 ‘관동별곡’)
○ 누나라고 불러 보랴/오오 불설워/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김소월의 ‘접동새’)
○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보다.(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 소쩍새들이 운다./소쩍 소쩍 솥이 작다고/뒷산에서도/앞산에서도/소쩍새들이 울고 있다.(장만영의 ‘소쩍새’)
위에서 보듯이 접동새는 우리 고전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새다. 두시언해에도 ‘접동새 오디 아니하고’나 최세진의 훈몽자회에도 ‘견(鵑)’을 ‘접동새 견’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접동새와 관련된 설화도 있다. 옛날 어느 부인이 아들 아홉과 딸 하나를 낳고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어미가 들어왔는데, 의붓어미는 아이들을 심하게 구박하였다. 큰누이가 나이가 들자 이웃 부잣집 도령과 혼인하여 많은 예물을 받게 되었다. 이를 시기한 의붓어미가 그녀를 친모가 쓰던 장롱에 가두었다가 불에 태워 죽였다. 동생들이 슬퍼하며 남은 재를 헤치자 거기서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갔다. 죽은 누이의 화신인 것이다. 관가에서 이를 알고 의붓어미를 잡아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재 속 에서 까마귀가 나왔다. 접동새는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까마귀가 무서워 밤에만 와서 울었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쓴 시가 김소월의 ‘접동새’이다.
과거에는 접동새와 소쩍새를 동일한 동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에는 접동새가 곧 소쩍새라고 설명을 했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에서도 접동새는 경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두견이의 방언이고, 소쩍새가 곧 두견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는 두견이는 우리말로 접동새라고 하고 한자어로 두우, 자류라고 설명한다. 일부 국어사전에는 소쩍새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생김새가 다르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송순창의 ‘한반도조류도감’(김영사)에서는 소쩍새는 올빼미과 동물이고, 두견이는 두견이과 동물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소쩍새의 북한 이름이 접동새라는 설명을 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접동새는 두견의 경남 지역 방언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전에서 두견을 검색하면
1. ‘동물’ 두견과의 새. 편 날개의 길이는 15~17cm, 꽁지는 12~15cm, 부리는 2cm 정도이다. 등은 회갈색이고 배는 어두운 푸른빛이 나는 흰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다. 여름새로 스스로 집을 짓지 않고 휘파람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휘파람새가 새끼를 키우게 한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귀촉도ㆍ두견새ㆍ두견이ㆍ두백(杜魄)ㆍ두우(杜宇)ㆍ불여귀ㆍ사귀조(思歸鳥)ㆍ시조05(時鳥)
2. 자규(子規)ㆍ주각제금ㆍ주연(周燕)ㆍ촉백(蜀魄)ㆍ촉조(蜀鳥)ㆍ촉혼(蜀魂)ㆍ촉혼조.
옛날 중국 촉나라의 망제가 쫓겨나 촉나라를 그리다가 죽은 넋이 귀촉도 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이 새는 망제혼, 불여귀, 자규 등 많은 이칭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표현은 두견이의 다른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쩍새는 다른 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소쩍새’를 올빼밋과의 여름새로 등은 어두운 회색이고 온몸에 갈색 줄무늬가 있으며 귀깃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낮에는 나뭇가지가 무성한 곳에서 자고 밤에 활동하여 벌레를 잡아먹는다. ‘소쩍소쩍’ 또는 ‘소쩍다 소쩍다’하고 우는데, 민간에서는 이 울음소리로 그해의 흉년과 풍년을 점치기도 한다. 조금 높은 산지의 침엽수림에 사는데 한국, 일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나, 실용적으로 보나 우리는 접동새가 익숙하다. 접동새는 전통적으로 써오던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표준어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아쉽다. 사전에서 두견(이)라는 한자어로 쓰는 것이 바르다고 하고 있으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더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