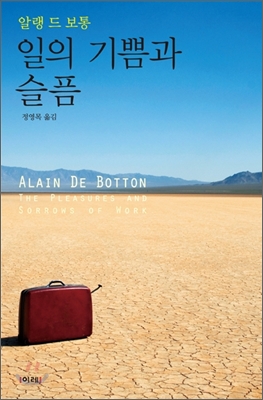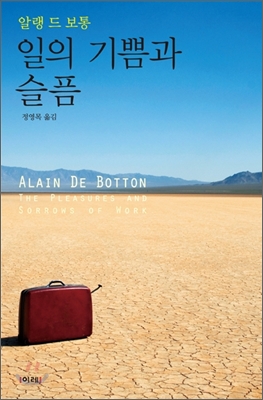
일상을 채우고 있는 ‘일’어떻게 오늘 하루 일은 잘 풀리셨습니까? <새교육>을 보시는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누구나 가르침을 받아보고, 직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볼 기회를 갖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하지만 한 발만 더 깊이 들어가도 그런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달라진 현실에, 교육과 교직을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금세 호기심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호기심은 독자 여러분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교직의 특성상 대학시절부터 교육을 전공해 장기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을 테고 대학친구들도 같은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기회가 더 적고 그만큼 궁금증이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일’에 대한 궁금증은 지구 저 편의 유명작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세계적인 작가반열에 올라, 우리나라에도 <불안>, <여행의 기술>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랭 드 보통이 이번에는 10개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직접 취재해 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에세이를 내놓았습니다.
저자는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일’인데 이 ‘일’을 표현한 예술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며 “현대의 일하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권태, 기쁨, 공포에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일’이 예술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기에 저자의 이러한 야심(?)에는 절로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 조명한다고 야심차게 출발한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가 결국 ‘사랑’과 ‘야망’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수차례 봐왔기에, 처음 책장을 넘기며 그가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을 조명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게는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책장을 몇 장 넘기지 않아 금세 해소됩니다. 영국에서부터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까지 직접 여행하며,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일에 대해 서술해놓았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철학과 말 못할 어려움, 보람 같이 웬만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서술하고 있음에도 작가 스스로 그 일의 세계에 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이랄까요. 풍부한 문학적 수사로 표현된 작가의 감상과 상상, 철학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일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타인의 일하는 모습에 자신과 자신의 일을 투영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결국 이 책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작가 자신인 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 한 것은 타자의 ‘일에 대한 정보’가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발견한 ‘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간 중간 발생하는 사건에 나름의 의미와 생각을 부여하긴 하지만 일의 의미를 한마디도 딱 잘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무도 다양한 일들을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분명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 말미에 나온 “우리의 일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팔게는 해 줄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말이죠.
| 강중민 jmkang@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