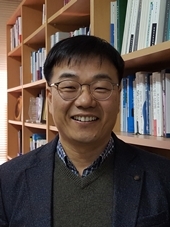
교육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교육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선거과정에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중시한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며 학교의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가치가 과장됐고, 필요 이상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모든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의 가치는 지적, 도덕적, 체력적(이하 전인(全人)) 성장에 있다. 인간의 지력과 체력이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성장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공교육체제(학교교육)는 인간의 사회화와 성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큰 의미를 지닌다.
학력‧성적 따른 과도한 차별 대우
그럼에도 공교육은 개인 간 격차를 좁히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인 간 격차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체제가 됐다. 사회는 학력과 성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대우를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 차가 과도한 보상 차로 연결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보통 이런 차별 대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쏟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국 좋은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상대적인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경쟁의 결과가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사회에서 선호하는 지위 또는 직업은 한정적이다. 모두가 노력한다고 그런 지위와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일부 승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선호하는 지위 또는 직업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물이다. 선호 지위 또는 직업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온전히 그 사회 구성원의 몫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직업 간,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줄인다든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기득권 집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경쟁이 교육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투자 이상의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도 얻지 못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배려’ 같은 규범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입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격차 줄이고 전인교육 지향해야 학교에서의 경쟁 조건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교에서 경쟁의 순위는 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정서적지지,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적 자원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가진 자원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성공한 소수의 ‘특별 혜택’이 학교교육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교육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은 모든 사람의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는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개인 차에 대해 과도한 차별을 지양하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그래야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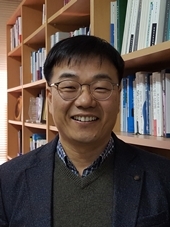 교육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교육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선거과정에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중시한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며 학교의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가치가 과장됐고, 필요 이상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교육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선거과정에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중시한다.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화두로 떠오르며 학교의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교육의 가치가 과장됐고, 필요 이상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