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에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서학개미’입니다. 일본은 닌자개미라고, 미국은 로빈후드(주식거래 앱 이름이 Robinhood이다)라고 하더군요. 자본시장에 뛰어든 전 세계 개인투자자들의 흥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취업하니? 나는 투자한다!” 뭐라도 하나 투자하고 계신지요?
포털에는 ‘주식투자 안 하면 가난해진다’는 카페가 생겨났고, ‘일주일 열공으로 차트 분석하기’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진짜 공부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경제학자들이 큰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서인지 주식투자 안 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의 잔치에는 늘 패턴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넘쳐나고, 그래서 특정 자산의 값이 오르고, 대중이 투자에 참여하고, 어떤 회사의 가치가 폭등하고, 더 많은 대중이 투자에 동참하고, 시장이 흥분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대중이 공포에 잠기고 어렵게 번 돈을 잃습니다. 언론의 반성이 이어지고, 정부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또 똑같은 드라마가 반복됩니다.
14세기 베니스에서는 채권투기가 성행했습니다. 1351년 정부는 채권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루머를 단속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물론 그 채권의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와 흥분 그리고 위기의 역사는 시장경제의 역사입니다.

#01 _ 정말 시대는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믿는 것일까?
1999년, 그때도 미국연방준비은행(연준 Fed)은 돈을 참 많이 풀었습니다.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를 뚫어야 했고, 무엇보다 인터넷(www)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한 방울만 튀어도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배가 올랐다는데, 그때 퀄컴은 2,500%가 올랐습니다. 1999년 한해 미 증시엔 547개사가 상장열풍에 올라탔습니다. 지난해 미 증시엔 480개 기업이 새로 상장됐습니다. 참 많은 부분이 ‘데자뷔’입니다. 빚내서 하는 주식투자도(미국의 신용거래 잔고는 800조에 육박합니다. 2020년 11월), 버핏지수도(GDP대비 시가총액), 주가이익비율(PER)이 불안불안 한 것도 닮았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최선봉에 선 것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 2000년 이후 굴뚝산업은 온라인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기업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주가는 폭락합니다. 미국 증시의 40%, 시총 8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 미 증시를 상징하던 야후(Yahoo)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말 전 세계 증시는 테슬라가 S&P지수에 편입된다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야후도 99년 S&P에 편입됐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20년이 지나 우리는 또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차장엔 전기차가 등장했고, 식당도 호텔도 죄다 앱으로 찾습니다(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힐튼과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훨씬 높다). 지난 분기 미국에선 모델 3가 ‘캠리’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세단이 됐습니다. “석유로 가는 차, 너는 이제 끝이야!”
#02 _ 가장 늦게 흥분한 사람이 자본의 제물이 된다
 2001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뉴욕이 공격당합니다.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1%까지 끌어내립니다. 돈이 다시 빠르게 풀렸습니다. 그러자 랠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홍콩의 그림시장까지. 이머징 마켓에 불이 붙고, 미국의 주택시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2001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뉴욕이 공격당합니다.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1%까지 끌어내립니다. 돈이 다시 빠르게 풀렸습니다. 그러자 랠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홍콩의 그림시장까지. 이머징 마켓에 불이 붙고, 미국의 주택시장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2006년에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순식간에 다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산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집값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7년 연속 집값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우스푸어’ 사태로 손실을 본 수많은 한국의 집주인들이 책임을 따진다면 결국 그린스펀이나 아니면 오사마 빈라덴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자산시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외부변수에 얽혀있고, 시장은 그래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산시장의 내일을 전망하는 것은, 에라토스테네스가 막대기 하나 세워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특히 가격예측은 거의 점성술사의 영역입니다. 가격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유 없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 오직 분명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라는 것과 이 잔치가 끝나고 겨울이 찾아오면 가장 늦게 흥분한 사람들이 자본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03 _ 나도 쉽게 돈 버는 행렬에 함께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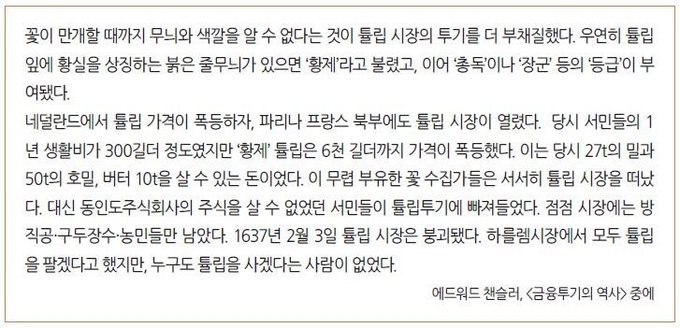
이 패턴은 너무 비슷해서 어느 시대의 자산거품이나 위기에 대입해도 거의 일치합니다.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고, 특정 자산에 사람이 몰리고, 큰 수익이 나고, 지나는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하고, 새 시대에 대한 거대한 믿음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고, 자산가치는 폭등하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언론은 어리석은 시장참여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상처가 겨우 치유될 무렵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립니다. 최근 버블을 우려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바클레이즈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마에스트로가 지휘합니다. 거장이 멈출 때까지 연주는 계속될 것입니다.” 연준(Fed/제롬 파월)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랠리는 계속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도 ‘마에스트로’로 불리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Alan Greenspan)은 1987년 블랙먼데이부터 아시아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1999년 2월 뉴욕타임스 커버에는 ‘지구를 살린’ 영웅으로 그린스펀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수백만 채의 주택이 압류됩니다. 집을 잃은 미국인들이 ‘내가 망한 이유’로 그린스펀을 지목합니다. 미국의 주택위기는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집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재정확대, 새로운 산업의 출현, 대중의 광기와 자산시장의 급등, 그리고 ‘나도 저 쉽게 돈 버는 행렬에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이 다시 되풀이됐습니다.
2009년 새해, 뉴욕타임스는 위기를 불러온 주범(원인) 12명(가지)을 꼽았습니다. 그 위기를 불러온 두 번째 주범으로 뉴욕타임스는 ‘그린스펀’을 지목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지구를 구했다’고 표지에 실었던, 바로 그 사나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뭘 잘 잊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