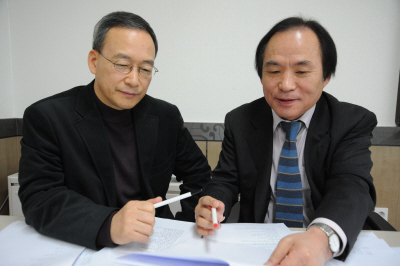이번 교원문학상 심사를 시작하면서 실은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컸다. 혹시 좋은 작품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자꾸 앞섰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늘 시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시를 가르치는 일과 직접 쓰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은 기우에 불과했다. 의외로 좋은 작품을 쓰는 분들이 많았다. 작품 수준도 고르고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비교적 상식적이고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만의 생각을 드러내는 개성 있는 목소리가 크게 아쉬웠다.
시 부문에서 가장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은 가작 ‘매미 울음을 볶다’이다. 이 시는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볶는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결부시킨 점이 놀라웠다. 어머니 첫 기일 날 ‘재수생, 대학생’과 ‘큰어머님, 작은어머님, 고모님, 누님들’로 표현된 식구들이 모여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을 퍽 활달하고 진솔하고 해학적으로 그려졌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가작으로 선정한 것은 당선작에 비해 작품의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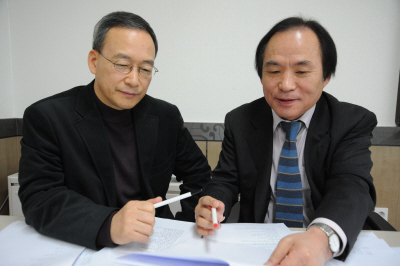
당선작 ‘꿈꾸는 장롱’은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결돼야 문학성이 높아지는가를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겠다. ‘장롱 속에 처박힌’ 옷에 대해 ‘나프탈렌 냄새나는 것일망정/ 바람을 쐬어 주어야 해/ 그래야 수의로 입을 수 있는 거야’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 시의 백미다. 입지 않고 장롱에 처박아 둔 평범한 일상의 옷을 ‘수의’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죽음을 성찰하게 하는 은유의 힘이 크게 돋보였다.
동시 부문은 눈에 확 띄는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다. 교사들이 아이들보다 동시를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었다. 어른이 동심을 지닌다는 것, 또 그 동심을 동시의 그릇에 담아 표현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당선작 ‘콧구멍 파는 아이’는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마음으로 쓴 점을 높이 샀다. 코딱지를 친구 손에 쥐어주고 도망간 아이나, 그게 화가 나서 뒤쫓아 가는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환하게 그려져 웃음을 자아내는 퍽 재미있는 동시라고 여겨졌다. 가작 ‘시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을 아이의 생각답게 쓰려고 노력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의 심상이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심사숙고했더라면 보다 더 좋은 동시가 될 뻔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