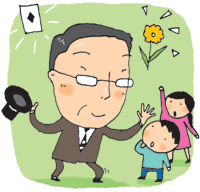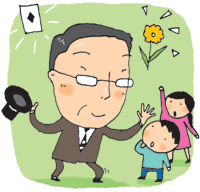
이곳에 발령된 지 두 달이 채 못 되는 지난 해 4월이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탐구심을 길러주고, 때마침 ‘과학의 달’이기도 해서 평소에 익혔던 마술을 보여주기로 했다.
‘교장선생님의 마술공연’이라는 말에 아이들은 물론이요 선생님들까지도 시큰둥한 듯 했다. 내심 걱정도 됐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것은 기우였다. 아이들의 시선은 나의 손놀림에 집중되었고 손가락 사이에서 나는 ‘탁’ 소리는 선생님들의 숨소리까지도 잠시 멎게 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공연 이후, 내 주위에는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잘 ‘마술하는 교장선생님’으로 불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하는 1학년 어린이 두 명이 연못가에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왔다.
“교장선생님, 또 마술 보여주세요.”
한 아이가 반가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는다.
“마술 도구도 없는데 무슨 마술을?”
“아무거나 한 가지만요.”
“음…, 그럼 너희들이 없어져버리는 마술은 어떠니?”
“한 번 해보세요.”
못 믿겠다는 눈빛으로 아이들이 나를 쳐다봤다.
“그런데 너희들이 없어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러자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금세 긴장으로 변했다.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이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줄 테니 잘 보세요.”
나는 손바닥을 펴서 한 아이의 얼굴 앞에 대고 마술하는 자세를 취했다. 순간, 아이는 놀란 표정을 하며 한 발 짝 물러섰다. 옆에 서있는 다른 아이는 벌써 교문 쪽을 향해 종종걸음을 걷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들이 마술에 의해 정말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내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순진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나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