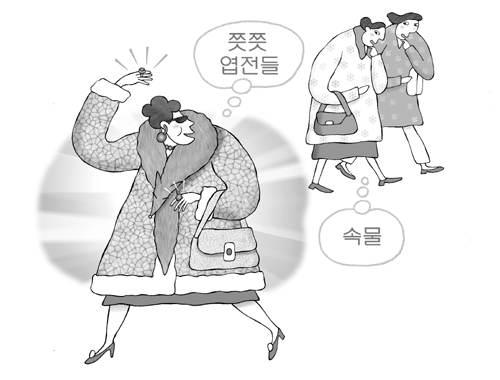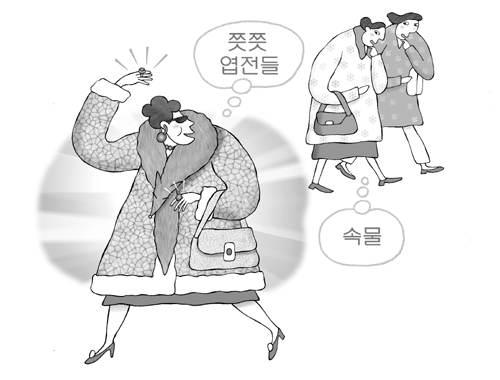
실생활에서 엽전이 사라진 지 오래 되었지만, 엽전이라는 말은 지금도 드물지 않게 쓰인다. “엽전들 같으니라고!” “엽전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이런 엽전들!” 등등의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굴 두고 엽전 같다고 하는가. 이 말에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알아차리겠지만, ‘엽전’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쓰이는 말이다. 엽전이 ‘못난 한국인’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엽전이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걸 막상 엽전이 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해 할 것인가.
엽전이란 말의 뜻이 이렇게 고약하게 쓰이게 된 연유를 《우리말 유래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그 사연이 이러하다. 개화기 무렵, 사용하기에 좋은 화폐인 종이돈[지전, 紙錢]이 새로 나왔는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이돈에 익숙해지지 않고, 옛날에 쓰던 엽전을 그냥 쓰기를 고집했다고 하는 데서 생긴 말이란다. 즉 이렇듯 낡고 낡은 인습에서 탈피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국 사람을 낮추어서 빗대어 쓰던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이돈이 처음 생겨나던 개화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엽전 같은’이라는 말이 생겨난 셈이다.
말이라는 것이 ‘발 달린 짐승’과 같아서 이런저런 맥락에 따라 그 뜻이 움직여 다니게 된다. 원래의 뜻이 묘하게 변하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엽전 같다’는 말도 일제 식민지 시대를 만나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만나게 된다. 즉 이 말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과 일부 친일 부류들이 우리의 민족성의 열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곡하여 사용된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일제는 이런 말의 용법을 의도적으로 널리 퍼뜨려서 일제의 지배가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다. 그런 연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방 이후에도 마치 굳어진 관용어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래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의 꼴을 면치 못한다. ‘엽전 같다’라는 말에는 이미 한국 사람을 깔보는 뜻이 들어 있는 말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더러 ‘엽전 같다’고 말해 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제 동포를 욕한 것이고 제 형제를 헐뜯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는 저는 한국사람 아닌 별나라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남들이 우리더러 엽전 같다고 한들 또는 지전 같다고 한들 그 까짓것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제 욕인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더러 스스로 ‘엽전 같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이 한량없이 희화화(戱畵化)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설사 ‘엽전’이라는 말이 민족의 자존(自尊)에 상처를 주고 있음을 모르고 쓴다 하더라도, 이 말을 즐겨 쓰고 싶은 사람의 우월심리를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머리에 지식푼이나 들었다고, 주머니에 돈냥이나 있다고, 명품깨나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저만 못한 사람을 향하여, 한 자락 깔고 한심하다는 듯이 ‘쯧쯧 엽전들’ 하고 혀를 차는 족속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알량하고 얄팍한 우월감을 주체하지 못하여 꼭 그렇게 ‘나 잘났다’는 티를 내어야 성이 차는 속물성(俗物性)을 여실하게 보여 주는 경우라 아니 할 수 없다. 자기 딴에는 그럴싸한 쾌감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속물의 전형이다. 속물적 속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달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진정으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자존심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의 강도는 터무니없이 강한 것이 자존감 부족한 사람들의 행태이다. 자기 못난 꼴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데에 ‘벌거벗은 임금님의 성격적 비극’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한번 잘못 배운 말의 잠재적 부작용은 이렇듯 인격에 침투되어 오래 간다. 그래서 말이란 무서운 것이다.
그런가하면 스스로 엽전임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나 원래 엽전이야! 나 원래 그런 놈이라구.’ 이렇게 말하거나, ‘나 같은 놈, 뭐 누가 알아나 줍니까.’ 이런 자세를 아예 깔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 꺼낼 때마다 ‘한국사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말끝마다 ‘뻔할 뻔자이지요.’, ‘별 수 있겠습니까. 뭐.’라는 말을 아예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선 될 일도 안 될 것이라는 게 너무도 뻔히 보인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강자에게 빌붙어 조금 우쭐해지면 남에게 거침없이 쓰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엽전들 같으니라고!” “엽전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남을 엽전이라고 지적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리고 스스로 엽전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엽전 같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자료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보았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자료에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가 대견스러워지는 내용들이 있었다. 소개하면 이렇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90%가 국기를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문맹률 1% 아래인 나라로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UN이 문자를 제공하는데, 바로 그 제공하는 문자에 한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다섯 나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평상시 좀 수치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각도를 달리하여 보니까 그런대로 용납할 만한 것도 있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율이 1위지만 차량대수를 비례해서 본다면 교통사고율이 24위인 나라이라는 것이다. 또 극심한 외환위기에 빠졌으나 가장 단기간에 IMF 통제 체제를 극복한 나라도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태 알고는 있었으나 그냥 열등감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자랑의 시각으로 볼 생각을 못한 것이다.
좀 코믹한 것들도 있었다. 미국도 무시하지 못하는 일본을 무시하는, 가장 배짱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중 한 번도 지도에서 중국이라고 표기된 적이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사소한 것에서도 자부심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예컨대 양치질을 세 번 하라고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전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라고 가르친단다. 남녀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이고, 분단국가들 가운데 통일 지지율이 50%를 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조금은 묘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아! 나는 왜 이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막연히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임은 헤아리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저 그럴 뿐,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필자도 일종의 엽전 의식을 무의식의 영역에서 지니고 있었다는 것일까. 말의 환경이 결국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들 마음의 영역에서, 그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의 영역이든, ‘엽전’을 몰아내는 일이 중요하다